|
|
[사설] 문화재 파괴 행위로 비난받을 4대강 속도전 |
문화나 종교, 예술에 대한 무지로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한다. 고대 유럽의 민족대이동 때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이 로마를 공격해 약탈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근현대사에서 오스만튀르크 군대와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 스핑크스에 포격을 가한 일은 반달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에서 오벨리스크를 세 동강 내어 로마로 가져온 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우상숭배라며 바미안 석불을 파괴한 일도 마찬가지다. 그에 버금가는 문화재 파괴 행위라고 비난받을 일이 우리나라 4대강 사업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4대강 문화재 살리기 고고학 교수 모임’ 자료를 보면, 농경지에 준설토를 붓는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 7500여만㎡ 가운데 제대로 문화재 조사를 거친 면적이 겨우 7%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3%에서는 형식적인 ‘1일 현장확인’만 거쳐 표토를 밀어내고 땅을 파는 작업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면밀한 문화재 조사가 생략됨에 따라 중요한 문화재들이 무더기로 사장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 문명의 기원을 알려줄 선사시대 유적이 대부분 큰 강을 끼고 발견되어 온 만큼 4대강 주변 농경지 조사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기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낙동강 18공구인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지구다. 이 지역에선 최근 청동기·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와 토기 조각들이 발견됐다. 수천년 전의 유물이 확인됐으면 사업을 중단하고 전체 구간을 정밀조사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뻘층 제거에 시간과 비용이 꽤 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정밀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농어촌공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준설토 쏟아붓기를 강행하고 있다. 문화재 관리 보존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이 공사의 효율성을 먼저 걱정하는 모양새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문화재를 이런 식으로 훼손하고 사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나라의 품격을 의심받을 일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전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라는 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를 위해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경남도와 충남도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화재 훼손마저 불사하는 4대강 속도전은 후대의 역사로부터 두고두고 비난받을 게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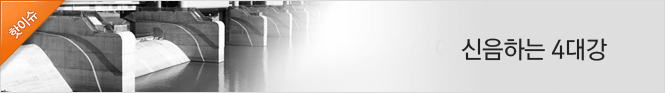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