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정기씨는 아들 박종철씨를 떠나보낸 뒤에도 생전에 쓴 편지나 물건들을 고스란히 간직해왔다. 86년 여름 집행유예로 풀려나 부산 집에 머물 때 찍은 종철씨의 증명사진이자 영정사진(왼쪽), 86년 초에 쓴 것으로 보이는 ‘85년 2학기 학생운동을 정리하며’란 제목의 친필 원고.(오른쪽)
|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30
대학시절 ‘자선사업가’로 불린 막내 철이(종철)가 돈 없는 후배들에게 책을 사주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건국대 농성으로 구속된 후배에겐 한 벌밖에 없는 자신의 겨울외투를 넣어 주었다. 한겨울 얇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후배에겐 두꺼운 겨울바지를 선물했다. 집회 시간이 다 되었는데 슬리퍼 차림이어서 곤란해하는 후배에겐 운동화를 사주었다. 하숙집 친구는 철이를 이렇게 회상했다. “과연 자기 자신을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종철은 늘 그렇게 바빴고 늘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끝까지 가지려고 하는 일은 종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이가 떠난 뒤 후배 한 명은 나(박정기)를 찾아와 구두를 건네주었다. “철이 형에게 받은 거예요. 유품이니까 받아 주세요.” 아들은 1987년 1월8일 선배 박종운에게 목도리를 건네준 이튿날 누나 은숙에게 전화를 걸어 목도리를 하나 더 짜달라고 부탁했다. 은숙은 털실 꾸러미를 사서 짜기 시작했다. 87년 1월14일, 내가 영문도 모른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서울로 올라갈 때 은숙은 두 뼘가량 목도리를 짜고 있었다. 87년 1월13일, 철이는 학교에서 6시간 동안 일본어 강좌를 들었다. 그 후 친구 두 명과 함께 289번 버스 종점 인근의 일미집에서 술을 마셨다. 친구 한 명이 먼저 자리를 뜨고, 저녁 8시 무렵 남은 한 친구와 하숙집 근처 주점에서 동동주를 마셨다. 두 사람은 밤늦게야 술집을 나섰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집에 거의 다다를 무렵,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종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형사들이 아들을 덮쳤다.철이는 형사들이 대기시킨 차에 실려 어딘가로 향했다. 바로 다음날 내가 도착하게 된 그 건물,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철이가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고문을 받고 있던 그 순간, 대공분실 514호실에서 서울대 대학원생 하종문도 단지 같은 하숙집의 옆방에 산다는 이유로 끌려와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 이틀 뒤 16일 아침 대공분실에서 나온 하종문은 철이도 이미 풀려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철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걱정하지 마. 난 한 대도 안 맞고 나왔으니까 신경 쓸 것 없어”라고 대답할 참이었다. 그가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다. “너는 운 좋게 나왔구나.” 하종문은 훗날 자신의 마음에 간직한 박종철의 의미를 어느 글에 남겼다. “(종철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옳은지 그른지를 비춰보는 거울이다. … 그는 나만의 비밀스런 증인이자 감시자인 셈이다. 그의 죽음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뒤흔들렸다.” 철이가 떠난 이후 가끔씩 철이가 쓴 편지를 꺼내 읽는 게 버릇이 됐다.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보낸 편지도 몇 통 있다. 그 편지엔 애비에겐 차마 말하지 못한 녀석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한 해 동안 난 배가 고픈 적이 무척 많았다. 때론 잠잘 곳이 없어서 늦은 시각까지 헤맨 적도 있었지. 하지만 그걸 고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활, 그런 배고픔이 나에게 던져 준 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내가 배울 수 없는 진한 삶의 교훈이었다.”(86년 1월6일) “난 죽기 전에 단 하루만이라도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소망이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든.”(86년 3월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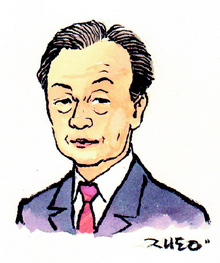 |
|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