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91년 4월27일 시위 도중 전경들에게 치사당한 명지대생 강경대군의 가족들이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안치된 강군의 주검을 확인하며 오열하고 있다. 왼쪽부터 누나 강선미, 어머니 이덕순, 아버지 강민조씨. <한겨레> 자료사진
|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84
1991년 4월27일 유가협은 서울 연세대에서 <어머니의 노래> 공연을 진행했다. 사회자 문성근(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등장하면서 무대가 열렸다. 문익환 목사의 막내아들인 그는 그때 한창 배우로 활약중이었다. 앞서간 이들을 기리는 독창과 합창이 이어지는 동안, 공연장 옆에는 백주대낮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한 청년의 주검이 안치되어 있었다. 연세대 정문 앞에선 학생들이 전경들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밤새 명지대생 강경대의 주검을 지키며 농성을 벌인 유가족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곡 한곡 노래를 불렀다. 1부는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소박한 심정을 담은 노래가 이어졌다. 2부 ‘잃어버린 꿈’은 자식의 죽음, 그리고 유가족의 좌절과 비탄이 주조를 이뤘다. 3부 ‘부활과 희망’은 자식들의 몫까지 껴안고 싸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희망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공연 전체가 유가족들의 삶 그대로였다. 박정기·배은심·이소선·전영희 4명은 독창자로도 나섰다. 배은심은 ‘창살 없는 감옥’을 불렀다. 박정기가 부른 ‘백범 추모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노래였다. “어허 여기 발 구르며 우는 소리/ 지금 저기 아우성 치며 우는 소리/ 하늘도 땅도 울며 바다조차 우는 소리/ 님이여 듣습니까? 님이여 듣습니까?” 원예중학교에 다닐 적 배운 박정기의 애창곡이었다. 그는 반백년도 넘게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 노래를 외우고 있다. 술자리에서 박정기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이오순은 눈시울을 적셨다. 유가족들의 무대 사이사이 가수들의 노래가 흘렀다. 공연 막바지에는 문익환 목사가 유가협 깃발을 휘날리며 극적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깃발엔 ‘산 자여 따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유가협 회원들이 모두 무대 위로 올랐다. 문익환은 유가족들을 끌어안고 마지막 노래를 불렀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청중은 기대보다 적었지만 잊지 못할 공연이었다. 하지만 오랜 준비와 상당한 비용을 들인 공연은 결국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 박정기와 유가족들은 공연을 마치자마자 인근 세브란스병원으로 건너갔다. 그동안 공연 준비와 간밤의 농성으로 모두 초주검 상태였지만 쉴 짬이 없었다. 박정기는 전날에도 리허설을 마친 뒤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갔다. 아직 강경대의 부모는 도착하지 않았고, 누나 강선미가 와 있었다. 박정기는 시체안치실로 향했다. 병원에선 시신 확인을 거부했다. “가족이 왜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요? 경대는 우리 유가협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 내가 보겠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딨나?” 박정기의 서슬에 병원 쪽은 손을 들었다. 강선미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경대의 주검이 나왔다.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얼굴 표정에 생기가 남아 있었다. 박정기는 눈을 감았다. 주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사진을 찍어둘 것을 요청했다. 언제 경찰에게 시신을 빼앗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가협 회원들이 영안실을 지키고 있을 때 강경대의 아버지 강민조가 도착했다. 그는 자식을 잃은 충격에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박정기는 그를 위로해야 하는지, 다잡아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유가족이 마냥 슬픔에만 빠져 있기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민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는 박종철의 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마음 굳게 먹으셔야 합니데이.” 유가협 회원들은 10명씩 조를 짜 번갈아가며 영안실을 지키기로 했다. 박정기는 매일 영안실을 오가며 밤을 지새웠다. 거리에서는 연일 저항의 횃불이 타올랐다. <어머니의 노래> 공연 이후 세상은 대항쟁 정국으로 거세게 흘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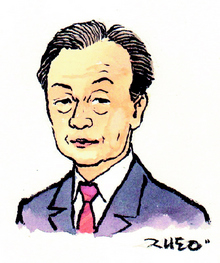 |
|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