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96년 9월 경원대 학생회관 앞에 서 있던 ‘송광영 열사 추모비’(왼쪽)가 하룻밤 사이 감쪽같이 사라진 현장(오른쪽). 박정기씨와 유가협은 교내에서 두 달 가까이 농성을 하며 경원대 총학생회·민주동문회와 함께 도난당한 추모비 반환 투쟁을 벌였다.
|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94
1996년 9월24일 경원대에 들어선 박정기는 학생회관 앞 ‘송광영 열사 추모비’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황당한 일이었다. 장정 일이십명은 모여야 옮길 수 있는 6톤 무게의 커다란 돌이었다.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 쪽에서 모를 리가 없었다. 미리 알아본 학생들은 도난범이 학생과장이며 경찰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학생들이 대처하지 못하도록 추석 연휴 직전에 일을 벌인 것이었다. 학교 쪽에선 유가협에서 나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희생한 이의 고귀한 뜻을 간직하지는 못할망정 추모비를 없애다니…생각할수록 분했다. 박정기는 혼자 학생처장실로 찾아갔다. “내는 유가협의 의장입니다. 광영이 추모비가 없어졌는데 우찌된 일입니까?” 학생처장이 대답했다. “저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가협은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갈낍니다. 추모비가 원상회복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더.” 유가족들이 모여들자 그는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추모비가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이나마 발전하고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의 생때같은 목숨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인데 어떻게 누가 감히 추모비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추모비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반환되지 않는다면 이 농성을 절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경원대는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으로 학내 분규가 많은 곳이었고 여러 열사들이 다닌 학교였다. 85년 송광영 이후 91년 천세용이 분신했고, 95년 학교 당국의 고소로 끌려간 장현구는 경찰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 끝에 분신했다. 96년 분신 정국 때도 진철원 학생이 분신해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투쟁중인 상황이었다. 박정기는 재야 운동가인 성남 산자교회의 김해성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유가협 사무국은 한울삶을 떠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이해학 목사와 김진균 교수도 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들과 송광영·장현구의 유가족 및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는 추모비가 사라진 자리에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경원대생들은 10월28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총장 퇴진, 추모비 탈취자 처벌, 학생 징계·구속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박정기는 경찰서장 면담에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때마침 열린 유가협 총회에서는 ‘송광영 추모비 탈취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회장단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유가협의 어머니들은 경원대 총장실을 점거했다. “학교 물건을 도난당했으니 책임자인 총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총장님이 직접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세요.” 어머니들은 김원섭 총장을 앞세우고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고소하게 했다. 대책위에서는 박정기와 이해학·김해성 목사가 협상단으로 참여했다. 학교 쪽에서는 총장과 학생처장이 나와 세 차례 협상을 벌였다. 박정기는 여러 차례 회유·협박을 받았지만 응하지도 굽히지도 않았다. 그러자 경원대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학생회관 앞이 좀 옹색하니 학교 옆에 있는 산자락에 새로 추모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경원대에서 제시한 자리는 학생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설령 눈에 잘 띄는 곳이라 해도 원래 있던 진리관 앞을 고수할 필요가 있었다. 박정기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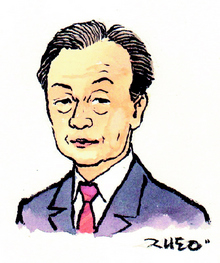 |
|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