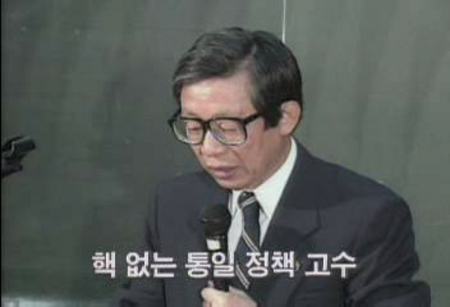 |
|
1993년 10월12일 필자는 모교이자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인간, 사회학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고별강의를 했다. 사진은 당시 ‘핵 없는 통일정책 고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문화방송>의 화면을 갈무리한 것이다.
|
한완상 비망록-햇볕 따라 평화 따라 (50)
1993년 10월12일 북핵 문제로 머리가 지끈거릴 무렵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고별강연을 하게 됐다. 오랜만에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니 신이 났다. 3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인간, 사회학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 고향에 돌아온 듯 푸근한 느낌이었다. 나는 먼저 불행했던 20세기의 한국 역사 속에서 구조적 질병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사회의사(소셜닥터)가 되고 싶어 55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했던 얘기부터 시작했다. “우리 세대는 청년기에 일제의 암울했던 식민지시대, 해방 아닌 해방, 6·25, 4·19, 5·16 등 시대의 격변을 겪었다. 독특한 세대였다. 역사와 사회의 구조적 질병을 고치겠다는 당찬 의욕을 가지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사회의사로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은 병든 권력과 직접 맞서는 위험한 행동이란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다. 유신정권과 5공 초기에 두 번이나 서울대 교수직에서 해임되기도 했고, 재야의 삶을 살면서 여섯번에 걸쳐 체포·구금을 당하기도 했다. 80년에는 내란음모사건으로 군사재판도 받았고, 잠시지만 서대문 구치소에 갇히기도 했다. 미국에서 3년간 외롭고 아픈 망명생활도 했다. … 무릇 모든 학문, 특히 사회과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의 구조적 질병을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처방은 더더욱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오히려 때때로 기득권층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일에 동료 사회과학자들이 적극 나서서 이데올로기적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었다. ‘부당한 인간 고통, 민족 고통을 극복해내는 일에 학문이 기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학자는 최선을 다해 진단을 내리고 실천적으로 처방을 내려야 한다.’ 바로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새 정부의 통일 문제를 다루는 국무위원 자리를 맡았다.” 이어 나는 인도주의 정신이라는 새롭고 과감한 패러다임으로 대북정책을 펼치려고 했으나, 북핵 문제가 터져서 냉전강경세력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국내 개혁은 힘차게 진행되는데, 남북관계는 뒷걸음질치는 것 같은 모순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다. 국내 개혁이 진행되어도 남북관계가 뒷걸음질치면 결국 평화도 자유도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11월12일 나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다. 북핵 일괄타결에 관해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북-미 일괄타결을 남한을 따돌리는 미국의 배신행위처럼 여기는 듯했던 것을 의식해, 미국도 일괄타결 방안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에둘러 답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열린 국회 국방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같은 질문을 받은 김덕 안기부장은 나보다 더 자세하고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북한은 현재 일괄타결과 유엔 제재라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 처지에서는 일괄타결이 가장 유리한 카드이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일괄타결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하지 않았다. 김일성 외에는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만일 북-미 협상이 실패하면 유엔 제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유엔의 대북제재도 촉구·경고·경제제재·군사제재 등 네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사제재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긴밀한 협조 없이 군사제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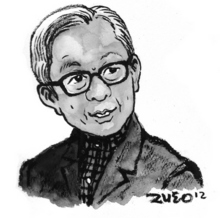 |
|
한완상 전 부총리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