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재식은 부산 피난 시절 강원용 목사를 통해 알게 된 ‘알로에 전도사’ 김정문 선생(오른쪽)과 평생토록 좋은 인연을 맺었다. 53년 여름 휴전 직후 서울로 올라온 뒤 김 선생이 조직한 기독교사상연구회에서 초대 총무를 맡기도 했다. 사진은 김선생과 초창기 기독교사상연구회 회원들.
|
오재식-현장을 사랑한 조직가 18
1951년 7월10일 38선을 두고 중부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는 와중에 유엔군과 인민군은 개성에서 정전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 포로 문제 등에 막혀 협상은 장기간 중단되었고 불안정하고 피폐한 부산 피난살이는 기약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오재식에게는 흐르는 시간을 반추하는 것도 사치였다.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기에 그는 날마다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부터 일거리를 찾아 부두나 시장통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생활에 쫓기면서도 대학 강의는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기독학생회 운동에도 열심이었다. 그나마 노옥신의 집은 부친이 고추장공장 등 식품 군납사업을 한 덕분에 제법 유복한 편이었다. 간혹 재식이 옥신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는데 “오빠” 하면서 반겨주는 옥신의 동생들과 달리 어머니는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낡은 미군 점퍼를 물들인 재식의 허름한 차림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재식이 피난지 부산에서 맺은 인연 중에 평생토록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 아니 한평생 도움만 받았던 ‘은인’이었다. 그는 바로 ‘알로에 전도사’로 알려진 김정문 선생이다. 재식은 김 선생을 강원용 목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김 선생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다 어머니가 18년간 교회 전도사를 했을 정도로 독실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수산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의 바람대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부산 고려신학교와 서울 장로회신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확신이 서지 않자 부산 동아대 문학부를 다니기도 했다. 김 선생은 청소년 시기부터 폐결핵으로 시작해 류머티즘 관절염, 위궤양 등 갖가지 병을 앓았다. 그러니 자연히 휴학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는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루는 그가 펼친 책에서 병약해 심신이 힘든 그를 가슴 뛰게 하는 구절을 발견했다. 영국 산업혁명 시절을 다룬 책이었는데, 탄광에서 온종일 일해도 가족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던 시절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경제정의를 요구하며 거리시위를 벌이는 장면이었다. 시위를 하면서 든 펼침막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자선은 싫다.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김 선생은 그 구절을 읽은 뒤부터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약자 편에 서게 되었다고 했다. 6·25가 터지자 그는 자신의 이층집을 개방해 피난민들을 받아들였다. 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 학생들이 많았다. 수십명이나 되는 피난민 학생들을 거둬 먹이는 데는 국제시장에서 포목상을 하던 어머니의 도움이 컸다. 그는 아예 ‘학생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기독교 학생운동을 벌여 나갔다. 또 주일마다 교도소에 설교를 다녔는데, 그때 교도소에 있는 병실에서 중환자들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실로암의원’을 열어 피난민들을 치료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도 부산지역 교회들이 아무런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한 그는 기독학생동지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정의롭고 평등하며 기독교적 사랑이 넘치는 사회 건설을 표방했다. 그즈음 서울에서 피난 내려온 김재준·강원용 목사, 함석헌 선생 등에게 가르침을 받게 된 그는 좀더 현실적인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기독학생동지회는 교회혁신과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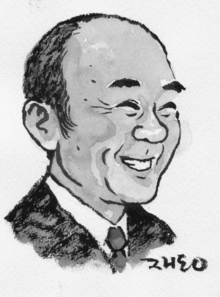 |
|
고 오재식 선생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