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953년 8월 휴전 직후 오재식은 기독학생회의 지도자인 강원용 목사(맨 오른쪽)의 갑작스러운 캐나다 유학 선언에 분노해 대놓고 맞서기도 했으나 만류하지는 못했다. 사진은 강 목사가 캐나다를 거쳐 뉴욕 유니언신학대학을 마치고 57년 귀국길에 오른 공항에서 환송을 받는 모습이다. 여해강원용목사아카이브 제공
|
오재식-현장을 사랑한 조직가 19
1953년 7월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재식은 환도한 뒤 다시 문을 연 서울대 문리대를 다니기 위해 8월께 서울로 올라왔다. 강원용 목사와의 인연으로 장충동 경동교회에 출석해 김재준 당회장에게 세례도 받았다. 그때 강 목사는 부목사였지만 휴전 직후 8월 부산에서 곧바로 캐나다 유학을 떠나고 없었다. 피난 3년 동안 강 목사의 활동이 워낙 광범위했던 까닭에 그의 돌연한 유학은 당시 기독교계에 적잖은 파란을 일으켰다. 특히 열정을 쏟아주었던 기독학생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재식은 강 목사와 평생토록 깊은 인연을 맺고 지냈지만, 사실 그와 부딪힌 적도 많았다. 두 사람을 두고 ‘오재식은 강원용의 수제자다’라고들 했지만, 사실 재식만큼 강 목사에게 반항도 많이 하고 대든 사람도 별로 없었다. 보통사람 같으면 까마득한 후배가 덤벼든다면 혼내고 내치겠지만, 강 목사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끌어안았다. 혼을 낼 때는 내고,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일단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 인간적으로 위로를 하곤 했다. 재식은 강 목사에게 특별히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셈이었다. 재식이 강 목사에게 처음으로 대든 것은 바로 그 캐나다 유학 파문이었다. 기독학생회를 조직해 놓고, 전쟁 중에도 새 시대 건설을 위해 희망을 가지라고 역설하던 지도자가 전쟁 와중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그를 따르던 이들에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재식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강 목사를 찾아가 단둘이 마주 앉았다. “목사님, 지금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들을 이렇게 모아 놓고 선동하시더니, 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린 어쩌란 말입니까?” “야, 너희 선배들 있잖아.” “아니, 선배들이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도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재식은 그만 흥분해서 핏대를 올렸다.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할 지경이었다. 강 목사는 그런 재식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로서도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강 목사는 만주 용정중학교의 은사인 브루스 교장의 주선으로 캐나다 매니토바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재식이 서울로 돌아올 때 노옥신은 부산에 남아 있어야 했다. 부친이 김치복과 함께 경영하고 있던 고추장 군납공장(동융산업)을 당장 접을 수가 없어 가족들 모두 부산에 남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52년 전시연합대학 시절 입학해서 다니던 이화여대 임시 캠퍼스도 서울로 돌아간 까닭에 옥신은 부산대에 편입했다. 그로부터 옥신이 다시 이화여대로 복학할 때까지 1년 남짓 떨어져 지낸 두 사람은 날마다 한두장에서 수십장까지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애를 이어갔다. 3년 만에 돌아온 서울 거리는 참혹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 중에 학생들도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교수들도 좌우대립 과정에서 월북하거나 납치·제명된 사람도 많았다. 학교 건물은 대부분 군사기지로 점령당했던 까닭에 엉망이 되어 있었다. 재식은 서울대 문리대 기독학생회 회장을 맡았다. 나이는 4살 많았지만 2년 선배인 양우석의 후임이었다. 재식과는 평양 산정현교회 시절부터 가까웠던 그는 전국기독학생연합회 회장을 두 번이나 맡으며 헌신했다. 회장 자리를 물려준 뒤에도 늘 후배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열성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기독학생회를 지키는 최전선의 용사처럼 보수파 기독학생회와 싸움에도 늘 앞장서 주었다. 그 덕분에 재식은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 속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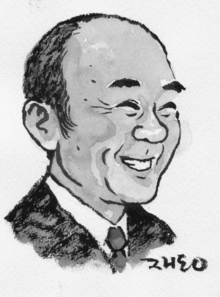 그 시절 서울대 문리대에는 46년부터 조직된 또다른 기독학생 모임이 있었다. 안병무·한철하·박순경·장하구·조요한 등이 독자적인 기독학생운동을 펼쳤다. 훗날 안 선생은 민중신학자로, 한 선생은 보수신학자로, 박 선생은 이화여대 교수가 됐다. 장 선생은 종로서적을 경영하며 향린교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조 선생은 숭실대 총장이 되었다. 조 선생은 안 선생 등과 같은 학년이었지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아 동기들보다 졸업이 많이 늦어졌다. 그는 재식이 훗날 와이엠시에이(YMCA)에서 일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재식이 속했던 기독학생회에는 이밖에도 이상설·조동빈·박세웅·이교상 같은 선배들이 있었다. 이들은 강 목사가 조직한 신인회 출신으로 경동교회 등 학교 밖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에 기존 기독학생 모임과 부딪힐 일은 없었다.
오재식 구술
구술정리 이영란/ <나에게 꽃으로 다가오는 현장> 엮은이
그 시절 서울대 문리대에는 46년부터 조직된 또다른 기독학생 모임이 있었다. 안병무·한철하·박순경·장하구·조요한 등이 독자적인 기독학생운동을 펼쳤다. 훗날 안 선생은 민중신학자로, 한 선생은 보수신학자로, 박 선생은 이화여대 교수가 됐다. 장 선생은 종로서적을 경영하며 향린교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조 선생은 숭실대 총장이 되었다. 조 선생은 안 선생 등과 같은 학년이었지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아 동기들보다 졸업이 많이 늦어졌다. 그는 재식이 훗날 와이엠시에이(YMCA)에서 일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재식이 속했던 기독학생회에는 이밖에도 이상설·조동빈·박세웅·이교상 같은 선배들이 있었다. 이들은 강 목사가 조직한 신인회 출신으로 경동교회 등 학교 밖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에 기존 기독학생 모임과 부딪힐 일은 없었다.
오재식 구술
구술정리 이영란/ <나에게 꽃으로 다가오는 현장> 엮은이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