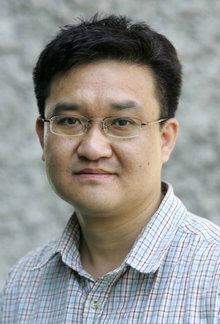 |
|
김동훈 기자
|
김동훈 기자의 직선타구 / ‘14, 36, 62, 8, 0, 12’ 마치 로또복권 번호 같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건 아니다. ‘0’도 있고, ‘62’도 있다. 에스케이 선수들의 등번호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김성근 감독이 지명한 ‘특타’(특별 타격훈련) 선수들이기 때문. 특타라고 특별한 건 없지만 샐러리맨으로 치면 퇴근 못하고 야근을 하는 것이다. 김 감독은 “예방주사 맞으러 병원 가는 아이들 같다”며 웃는다. 에스케이는 지난해 7월15일, 잠실 엘지전에서 7연패에 빠졌다. 감독 부임 이후 최다 연패였다. 김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타자들을 인근 경기고 운동장에 집합시켰다.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까지 ‘달빛 특타’를 시켰다.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다음날 1회부터 6점을 뽑으며 연패에서 벗어났다. 올 시즌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13일 한화와의 원정 3연전 첫 경기에서 고작 4안타만 쳤다. 팀은 1-2로 졌다. 김 감독은 다음날 2차전을 앞두고 타자 5명을 데리고 대전고 운동장에서 특타를 지휘했다. 마치 ‘족집게 과외’를 시키듯 효험은 또 나타났다. 에스케이는 이날 11안타를 몰아쳤고, 이 가운데 7안타를 ‘특타조’가 책임졌다. 팀도 6-1로 이겼다. 김 감독은 “특타 친 아이들이 7개나 쳤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김성근 감독 별명은 잘 알려진 대로 ‘야신’(야구의 신)이다. 야구판에서 잊혀져 가던 그는 2006년 10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에스케이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만년 하위팀 에스케이를 2년 연속 정상에 올려놓았다. 올 시즌에도 10연승으로 선두를 굳게 지키며 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태평양, 쌍방울 등 만년 하위팀을 맡았다 하면 포스트시즌에 진출시켰고, 2002년에도 꼴찌로 추락한 엘지를 시즌 중간에 맡아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한마디로 ‘미다스의 손’이다. 전문가들은 그 비밀을 특타에서 찾고 있다. 에스케이 특타에는 정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 특타조에 개근하다시피 하는 정근우는 “특타를 하고 나면 일단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지난주 특타를 한 타격 1위 박정권은 “심리적으로 조급했는데 특타를 하면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했다. 김 감독은 “특타는 실력이 모자란 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타격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하는 것”이라며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에스케이는 김 감독 부임 이후 타격왕도, 홈런왕도, 타점왕도 배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팀타율 1위에 올랐다. 비범함은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 김 감독은 오늘도 로또 번호 맞히기에 열중이다. 김동훈 기자cano@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