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대강 사업으로 수심 4m 깊이까지 강바닥이 준설됐던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 아래쪽 낙동강 본류와 지류인 감천의 합류지점 가장자리에 27일 드넓은 모래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감천에서 쓸려내려온 모래·자갈이 준설이 끝난 강바닥 위에 다시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을 벌인 뒤 낙동강은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구미/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4대강 완료 1년, 그 뒤…깡통·술병·죽은고기 떠다녀
북한강 자전거길 비만 오면 쑥대밭…‘신음하는 4대강’
|
|
지난 7월10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포기했다던 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임이 밝혀졌다. 숨겨졌던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4대강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겨레는 4대강의 현장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4대강의 복원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
|
|
둑은 깎여 나가고, 모래는 다시 강에 쌓이고, 강물은 녹조 발생 위협에 시달린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1년 안팎에 이른 요즘,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식수와 농업·공업용수를 제공하는 낙동강은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525㎞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댐이나 다름없는 대형 보 8개로 나뉘어 이어진 9개의 호수로 바뀌었다. 강폭 500~600m, 수심 4~6m로 대규모 준설을 마친 본류에는 다시 모래와 흙이 군데군데 쌓이고 있다. 본류로 흘러드는 지류 곳곳은 하류 쪽부터 상류 쪽으로 침식이 번지는 ‘역행침식’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에 막혀 강물의 흐름이 느려진 뒤로는 녹조가 종전에는 보기 어렵던 중상류까지 위협하고 있다. 보로 가두기는 했으나 쓰일 곳을 찾지 못한 물이 호수로 변해버린 강 곳곳에서 썩어가는 현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량 확보와 가뭄 해소 약속은 의미를 잃었다. 홍수 피해를 막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낙동강 지천 하류 쪽 주민들에겐 전에 없던 수해 걱정이 늘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결론지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로, 26~27일 <한겨레> 취재진은 낙동강(보 8개)과 한강(보 3개), 금강(보 3개), 영산강(보 2개) 등 4대강 사업 주요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 낙동강 중상류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하류 1.9㎞ 지점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용호천. 말이 지천이지 호수나 다름없었다. 물이 본류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음료수 깡통과 비닐, 술병 등이 떠다니고 있었다. 고인 물은 마치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 현상이 심각했다. 물가에는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다.
감천 등 지류 역행침식 심각…둑 무너져 곳곳에 ‘절벽’
용호천의 양쪽 둑은 무너져내려 절벽을 이루고 있었다. 낙동강 본류를 대규모로 준설한 탓에 본류와 지천의 낙차가 커지자 합류 지점부터 용호천의 흙과 모래가 쓸려 내려가는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엔 둑 일부가 무너져내렸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 하류 1㎞쯤에 흘러드는 지류인 감천도 심각했다. 지난해 이맘때 이곳은 역행침식으로 양쪽 제방 일부가 무너져내렸다. 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번져갔고, 제방의 풀과 나무 모두 사라졌다. 지금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합류 지점에서 1.5㎞ 상류 쪽 남산교는 바닥의 흙과 모래가 본류로 휩쓸려 내려가 다릿발 하단부를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다릿발 하단부 1~2m가량은 상단부와 색깔이 달랐다. 흙과 모래로 덮여 있던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과거 강바닥 높이를 고려했을 설계 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무의미해진 셈이다.
 |
|
역행 침식이 진행된 경북 구미시 선산읍 원리 구미보 하류 감천 합류 지점이 27일 흙이 깍여 나가 흉물스런 모양을 하고 있다. 구미/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지천 물 본류로 못빠져나가
깡통·비닐 떠다니는 호수로
다리 하단부도 속살이 훤히…
“올 태풍 어떻게 견딜지 걱정”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대형 보 때문에 낙동강 본류 수위가 올라가며 지류·지천의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다, 큰비가 오거나 본류 녹조를 막으려 보를 열면 지류의 흙·모래가 쓸려가고 제방이 터지곤 한다. 이런 역행침식이 상류 쪽으로 확산되면 지천의 다리들이 붕괴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경북 고령·김천 지역은 홍수 때도 농경지 침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곳이었다.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냈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침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9월16~17일 태풍 산바가 고령·김천에 각각 192㎜와 261㎜의 비를 뿌리자, 고령에서는 낙동강 지천인 회천과 주변 소하천의 제방이, 김천에서도 율곡천 등의 제방이 터졌다. 이 때문에 고령과 김천의 농경지가 각각 277㏊와 926㏊ 침수됐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일어난 뜻밖의 물난리에 의아해하며 다가올 태풍을 걱정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 지역에서 4㎞쯤 하류에 건설된 합천·창녕보 때문에 수해가 났다고 주장한다. 보 때문에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지난해 큰비가 왔을 때 지류의 물이 재빨리 낙동강 본류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민 곽상수(43·고령군 우곡면 포2리)씨는 “예전에는 그 정도 비에 끄떡도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더니 제방이 붕괴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났다”고 말했다.
낙동강을 따라 조성한 자전거도로도 곳곳에 보수공사 흔적을 안고 있었다. 26일 오후 경북 칠곡군 석적읍 ‘칠곡보’ 남쪽의 왜관읍 낙동강 자전거길은 아스팔트 바닥에 균열이 보였다. 100m쯤 구간에 흙이 움푹 파였고, 흙포대가 그 틈을 메우고 있었다.
■ 낙동강 중하류 낙동강 중하류인 경남 구간에는 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지류에서 떠내려온 흙·모래·자갈 등이 쌓이는 ‘재퇴적’ 현상이 곳곳에서 두드러졌다.
지류·지천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점에선 어김없이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류에 흘러간 모래·자갈이 본류에 다다르면 갑자기 느려지는 물살 때문에 멈춰 쌓이는 것이다. ‘창녕·함안보’ 하류 600m 지점에는 자갈로 뒤덮인 섬까지 생겼다.
‘합천·창녕보’에서 하류로 1㎞쯤 떨어진 낙동강과 황강의 합류 지점 부근에는 길이 300m, 너비 100m가량의 모래톱이 생겨나 철새들의 쉼터 구실을 하고 있었다. 이보다 500m쯤 하류 쪽에는 해수욕장을 방불케 할 만큼 널찍한 모래사장이 형성돼 있었다. 이 일대의 강폭은 4대강 사업이 끝난 직후 440m였으나, 재퇴적으로 이제 300m가 채 안 될 정도로 다시 줄어 있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준설-재퇴적-준설-재퇴적이 되풀이돼 큰 비용을 들여 준설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란 지적이 거듭됐다.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 관계자는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준설을 해야 할 만큼 쌓인 것은 아니다. 적정한 시점이 되면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낙동강 지류·지천의 하류에는 시퍼런 녹조가 확산되고 있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지천 하류부에서 유속이 급격히 느려지면서 녹조가 발생한 것이다. 전에는 거의 없었던 상류에서도 녹조 현상이 관측되곤 한다. 반면 낙동강 본류에는 경북과 경남의 경계 지점인 율지교 부근에서만 강폭의 3분의 1가량 옅은 녹조가 비칠 뿐이었다. 최근 한달 남짓 비가 거의 오지 않은데다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가자 수자원공사가 녹조 확산을 막으려고 낙동강 8개 보마다 초당 평균 240㎥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감병만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정도 차는 있더라도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본류에서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예전에는 없던 현상이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만 10억t의 물을 확보했다는데, 녹조를 막는다며 이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니, 이런 대규모 토목사업을 왜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을 낀 지방자치단체들은 낙동강과 주변 둔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구미시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낙동강 둔치 8.7㎢에 660억원을 들여 골프장과 오토캠핑장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대구시도 지난 2월 대구 달성군과 경북 성주군을 잇는 성주대교 인근 낙동강변에 자동차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달성군 다사읍 죽곡·매곡취수장에서 상류로 불과 6㎞쯤 떨어진 곳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불렸다. 경남 함안군은 지난달 20일 칠서면 낙동강 둔치 2만1000㎡에 오토캠핑장과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문을 열었다.
27일 오후 창녕·함안보에서 가까운 창녕군 칠북면 봉촌리 밀포마을 둔치 앞 낙동강에서 관광객 1명이 보트에 매달려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밀포마을 주민들이 강변에서 농사를 지었던 곳이다. 하지만 보트 1대 말고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수심이 6m가 되도록 준설한 탓에 예전처럼 모래사장에서 놀거나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강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낙동강 중하류는 넘실대는 물결을 그저 눈으로만 바라볼 뿐인 강으로 바뀌어 있었다.
낙동강/최상원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 관련기사 보기 : ‘갇힌 강’의 역습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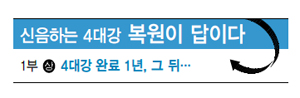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