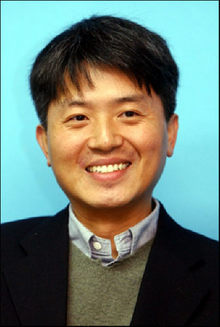 |
|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세상읽기
가슴에 손을 얹고/ 살그먼-히 눈을 감으면/ 어느새 그대는 내 앞에 나타나/ 깊흔 잠속에서도/ 나는 그대를 잊지 않었고/ 그대도 나를 버리지 않었다/ 꿈, 꿈, 꿈일지라도/ 그대는 내 마음속에/ 꽃봉오리처럼 아름다히 피어올라/ 젊은 내 심장을 격분시키노니/ 오, 내 사랑이여/ 영원한 나의 애인이여!/ 그대의 반가운 소식을 들을 때/ 삼천리여, 나의 조국이여!/ 나는 하늘만큼 깃버하노라/ 그 긴 겨울밤이 물러가고/ 새벽의 고요한 짬에도/ 너는 내 눈앞에 어리어지드라한눈에 보아도 격정만 가지고 썼음을 알 수 있는 이 시는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 컬리지파크에 있는 미국 국립문서관의 ‘북한군 노획문서철’에 남아 있다.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고〉이고, 지은이는 최원오라는 젊은이로, 이 시를 지을 무렵에는 중앙아시아 타슈켄트의 한 농대에 유학 중이었다. 그는 당시 북한 재정상을 지낸 최창익의 손자로서 절절한 조국애를 표현한 이 시는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들어 있다. 조부와 손자가 주고받은 사사로운 편지들이 이국의 한 문서고에서 잠자고 있을 때는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노획문서철은 한국전쟁 중 미군이 한반도에서 수집한 문서들을 하나의 문서철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미군은 한국전쟁 중 적의 문서들을 노획하기 위해 꽤나 용의주도하게 움직였다. 노획문서의 대부분은 미군의 평양 진주 때 나왔는데, 미군 방첩대는 평양 입성 이전에 문서를 노획하고자 인디언헤드 특별부대를 구성하였다. 이 부대는 전투부대보다 먼저 평양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정보수집 대상물을 장악하였고, 작전은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획문서철은 해방 이후 북한에서 나온 각종 공·사문서, 책, 신문, 잡지 등 온갖 기록물과 출판물, 시각자료로 구성된다.
자료를 많이 접하다 보면 자료의 내용보다 형식과 외양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 문서철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출간한 레닌이나 스탈린 저술의 한국어 번역본은 매끈한 종이에다 인쇄상태도 양호하고 제본도 잘 되어 있다. 반면 당시 고등교육기관들에서 사용한 과학기술 관련 교과서들은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듯한 형편없는 지질에다 인쇄상태나 제본도 조악하다. 마치 당시 남한에서 발간된 미군정 홍보물과 한국인 출판물의 외양의 대비와 흡사하고, 식민지 상태에서 갓 해방된 나라와 그 나라에 주둔한 강대국 처지의 차이를 반영하는 듯하다. 당시 한반도 주민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좋은 지질에 인쇄된 외국 제도나 이념의 선전이 아니라 비록 과학기술 교과서처럼 ‘똥종이’에 인쇄되었지만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새나라 건설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 아니었을까.
8·15가 코앞이다. 해방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연구자들은 그 당시 생산된 자료를 보고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하고, 그 자료들은 여전히 ‘노획문서’ 등의 전쟁용어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반도는 분단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획문서’ 자료 목록을 만드느라 몇 주째 대학원생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작업의 의의에 공감하고 기꺼이 방학을 할애한 이 젊은이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지금 이들이 보는 자료들은 증오로 얼룩진 분열의 기록들이지만 이들이 앞으로 쓰고 만들어가는 역사는 화해와 통일의 역사가 되기를 바란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