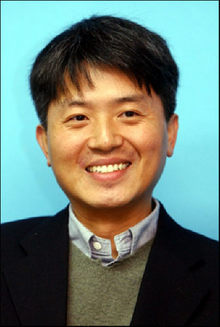 |
|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세상읽기
미국 쪽 관련자들의 발언을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드디어 국방비 비용 부담 논란으로 넘어갔다. 8월14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여당과 야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장기적으로는 작통권 이양을 통해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며 “이 문제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날인 15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작통권 행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한 술 더 떠서 “북한은 한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쏟아냈다.작통권 환수에 대한 초기의 반대논리는 “작통권을 통해 자주권을 찾아오겠다는 논리는 바로 북한의 논리”라는 것이었다.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야당은 국민투표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야당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84%가 작통권 환수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져 한-미 동맹이 붕괴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 쪽 관련자들의 발언이 쏟아지면서 한-미 동맹 붕괴론과 안보불안론도 휩쓸려갔다. 그리고 이제 논란은 작통권 행사에 따른 ‘비용’ 문제와 현 정부의 ‘자주 장사’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갔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 발언에서 작통권 환수를 지지하는 여론을 가리켜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은 자주회복이라는 말에 국민의 50% 이상이 최면에 걸렸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들어 불거진 한-미간 현안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나 ‘자주’ 문제로 귀결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의 구조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한-미 관계도 변화를 강요받기에 이르렀고, 그것에 필요한 기회비용을 누가 치를 것인가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단선적 주장이 레토릭으로서, 또는 정쟁의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작통권 환수 논란에 대한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동맹 재편 작업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작통권 이양을 포함한 주한미군 재편 작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이양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히고 주한미군 재배치 작업 일정에 맞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면 작통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주적’일까.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병력을 운용하길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합사 체계를 깨고, 주한미군을 단독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월 워싱턴 한-미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했다. 그 이후 현재의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적 대테러전쟁을 위한 신속기동군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작통권 변화는 우리의 주권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주국방의 논리로만 환원할 수 없다. 작통권 논란이 생산적인 논의가 되려면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흠집내기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찾는 논쟁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는 한국을 발진기지로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와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행동의 자유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한국이 미국 군수업체의 첨단 군사장비와 무기 수출시장으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방안을 포함하는 창조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