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24 17:19
수정 : 2006.09.24 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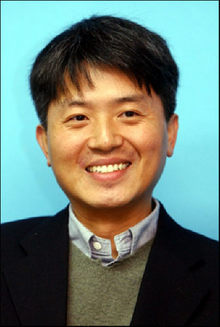 |
|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세상읽기
5년 전 미국에 머물 때 일이다.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명문대에 머물렀는데 그 대학 교수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좌에 올랐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곤 했다. 2000년 미국 대선은 양식 있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선거 제도의 결함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앨 고어는 전체 득표에서 30만 표 가량 앞섰지만 주별로 다수당이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로 인해 결국 선거인단 수에서 뒤졌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 주지사로 있던 플로리다주의 의혹에 찬 투·개표 과정이 한몫했다.
그 당시 미국의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은 플로리다주 투·개표 과정을 의혹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법원이 새 대통령 선출을 확정하자 그 결과에 승복했고, 이후에는 그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를 견제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 집권 초기에 그의 여당 지지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을 탄핵하는 몰상식이 가능한 사회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지 어디 탄핵소추를 강행할 사안이었나. 임기 한 달 남은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 남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국정 공백을 초래한 것이,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있을 법한 일인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제도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내 보였지만 미국 사회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반면 한국은 일단 선출한 대통령의 권위도 부인하는 몰상식이 가능한 사회이고, 그러한 행위의 연원은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데 있지 않겠는가. 탄핵사태로 우리 사회가 겪은 피해는 그것으로 초래된 혼란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들인 엄청난 기회비용에 잘 나타난다. 두 사례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확립한 민주적 제도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타이의 쿠데타를 빗댄 정치가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타국의 쿠데타를 빗대어 쿠데타적 발상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문민정부 초기의 역사바로세우기 캠페인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특히 5, 6공 청산과 관련해서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을 현대사 재해석 작업과 연결한 것이었다. 덕분에 ‘5·16 혁명’도 ‘쿠데타적 사건’이 되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명명한 ‘쿠데타적 사건’은 나름대로 절묘하다. 문민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정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김영삼의 민주당과 김종필의 공화당을 끌어들인 3당합당에 의해 태어난 정권이다. 김종필은 5·16 주체였고, 정권 기반의 다른 한 축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어쨌든 한국 사회는 쿠데타와 독재로 희생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30년 이상 고투를 벌여야 했다.
‘쿠데타적 사건’이란 용어는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3당합당은 소속 당원의 의지나 그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밀실 야합에 의해서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런 면에서 쿠데타적 사건이다. 한국 사회 민주화의 한계가 금세기 들어 쿠데타적 발상으로 간헐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쿠데타적 발상이란 기득권을 수호하거나 권력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또 국민이나 군대를 민주 사회의 주체나 구성원이 아니라 동원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그러한 발상은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장벽의 하나일 뿐이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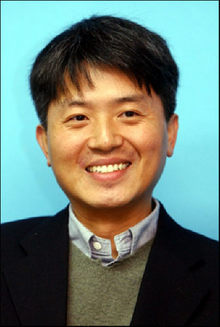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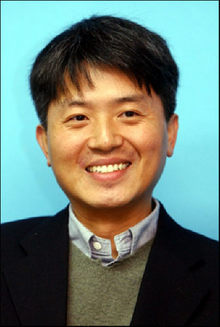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