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11.26 18:29
수정 : 2006.11.26 1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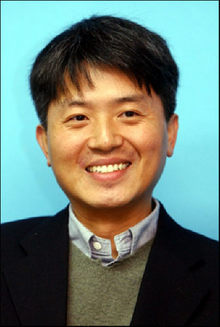 |
|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세상읽기
수능이 끝났다. 올해도 약 60만명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자신의 ‘수학능력’을 하루 동안 필사적으로 불살랐다. 그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여기서 질문. 이들 중 세계사를 공부해서 시험을 본 학생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모르겠지만 수능 실시 이전 모의고사 자료를 보면 3만명이 채 안 되는 것은 확실하다. 나머지는 고교 과정에서 세계사를 전혀 배우지 않았거나 최소한 시험공부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60만명의 수험생 중 57만명이 중학교 때 배운 것이 세계사 공부의 전부라니! 너도나도 ‘세계화’를 부르짖는 나라의 사정으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중학교에는 ‘세계사’라는 과목이 없다. ‘사회’ 과목이 있을 뿐이다. 세계사는 사회 교과서 여기저기에 끼워져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대부분 역사 전공자가 아니다. ‘국사’는 그래도 역사 전공자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는 지리나 일반사회 전공 선생님들 몫이다.
그럼 국사는 사정이 좀 나을까? 별로 그렇지도 못한 것 같다. 역시 올해 수능을 예로 들자면, 국사를 선택한 학생은 6만명이 채 못 된다. 세계사보다는 좀 낫지만 전체 학생 중 겨우 10%만 국사를 공부한 셈이다. 하기는 점수 1점에 애가 타는 학생들에게, 그 많은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에, 그것도 주당 2시간 수업으로 다 배워야 하는 국사를 선택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한국 근현대사’라는 또 하나의 선택과목이 있지만, 이것 역시 다른 사회 과목에 비해 선택률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국사나 한국 근현대사는 암기할 것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데 비해 점수 따기는 어려운 과목일 뿐이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대학 신입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은 빈곤하다 못해 위험할 지경이다. 아니 역사적 사고력을 운운하기엔 역사 사실에 대한 기초 지식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그깟 역사가 무슨 대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어디 있냐고,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일수록 지식 그 자체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 분석·비교하면서 그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 행동 양식의 변화를 탐구하는 인문학으로서 역사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까지 역사를 무기 삼은 이웃나라의 도발이 있을 때에만 냄비 끓듯 ‘역사교육 강화’의 공허한 구호를 외치다 말 것인가?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역사를 사회과 안에 포함시키되, 세계사를 사회에서 분리해 별도의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역사전공 교사를 확충하며, 고교 1학년 〈국사〉에 근현대사를 보강하고, 늘어난 학습량만큼 재량활동 시간을 〈국사〉에 배당하여 가르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발표된 바 없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진의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최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인문학 위기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역사교육이 입시제도의 볼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유를 기대할 것이며, 또 이렇게 역사교육이 방기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창조적인 역사적 상상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도대체 역사교육 강화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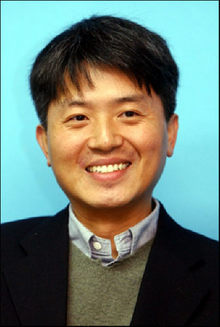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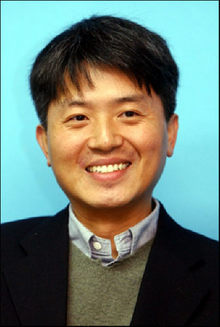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