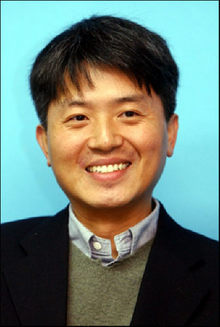 |
|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세상읽기
‘2·13 합의’ 직후만 해도 그것의 실현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양쪽은 의외로 빠른 속도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래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일촉즉발 대결 상태로 회귀한 경험이 몇 차례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적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북-미 관계다. 하지만 회담장을 나서는 양쪽 협상대표들의 얼굴에 감도는 웃음은 관계 정상화로 가는 북-미 협상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그런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일 국교 정상화 실무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일본은 납치문제만을 부각하려는 융통성 없는 협상태도를 고집했고, 북한은 6자 회담에서 합의한 일제강점 배상 등 과거청산 문제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고자세를 유지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대북 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 때리기’를 통해 국내정치에서 지지율을 높여 온 아베 신조 총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대북 태도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외교적 실패를 북한 때리기를 통한 국내에서의 인기 만회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아무래도 졸렬한 대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망언을 거듭한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는 아시아인들한테는 무시와 역사 왜곡으로 대응하는 반면, 과거사 문제를 대미 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자세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구조적 폭력은 외면한 채, 동원의 강제성 여부에 매달리는 일본 지도층의 자기기만적 역사인식이 가소롭고 안쓰럽다.
한국 안에서도 ‘2·13 합의’를 애써 평가절하하거나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 재료로 삼아 합의 실현 노력을 훼방하는 분위기가 일각에 존재한다. 심지어 일부 논자들은 한국이 나아갈 길은 남한이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 손잡고 북한·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현실인식을 들먹인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일제 식민사관은 한국인이 한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타율성론과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숙명적으로 대륙세력이나 해양세력 어느 한쪽에 붙을 수밖에 없다는 반도성론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해양세력 제휴론은 식민사관의 재판인 셈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착 과정이 과거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행위의 진상규명 등 과거사 정리 문제를 제기했듯이, 2·13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 과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나 냉전으로 야기된 역사왜곡의 시정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것이다.
2·13 합의가 나온 직후 개성공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첫 제품이 생산된 것이 불과 2년여 전인데, 2007년 1월에 생산총액 1억달러를 달성했고, 고용 노동자 수도 1만1천명을 넘었다고 한다. 개성은 6·25 전쟁 당시 휴전협상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분단 고착화의 민족적 비극이 비롯된 바로 그곳이 이제 남북 화해와 공조,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 지난 100여 년 한반도의 운명은 항상 바다 건너에서 결정되었다. 이제 그 운명의 키를 남북 주민이 돌려받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렵사리 만들어낸 교류와 협력의 불씨를 더욱 북돋아야 할 때다.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