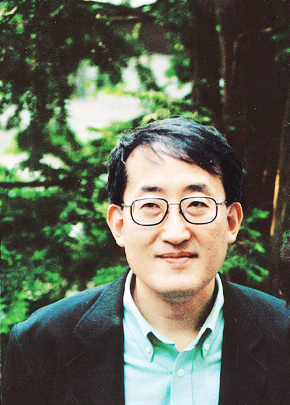 |
|
조효제/하버드대 로스쿨 인권펠로
|
세상읽기
미국에서 공부한 적도, 미국 경험도 별로 없었던 내가 이 나라에 머물 기회를 얻었다. 미국 사회를 알고 싶어 일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신문도 열심히 읽었다. 그러나 그 관찰은 짧은 기간, 대학이라는 특수공간, 그리고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언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미국에 대해 무엇을 느꼈던가? 겉핥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대외정책 주체로서의 미국을 평가하는 것과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우리의 인식은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우선, 대외정책 주체로서의 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비판과 내 경험적 관찰이 대부분 일치하였다. 거대한 영향력을 배경 삼아 어찌됐건 자기 체제가 옳다는 우월주의, 공격적인 시장경제, 편집광적인 안보의식, 자기가 설정한 악(공산주의·테러리즘)을 무찌르고 미국을 수호하는 일이라면 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수단도 선으로 보는 태도, 서구와 비서구를 은연중에 구분하는 인종주의적 편견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단연코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미국의 위압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가 미국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까지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국이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서 미국의 생활양식과 문화·교육까지도 객관적으로 확고부동한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또다른 차원에서 미국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보수든 진보든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적어도 내가 체험한 미국은 그다지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사회가 아니었다. 단순하지 않고 모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였다. 놀라운 유능함과 가소로운 무능함이 공존하는 나라였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유치한 환상이 합쳐져 네오콘과 창조론이 버젓이 지적 시민권을 획득한 나라였다. 법질서를 존중하는 것과 잘못된 권위에 맹종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라였다. 과시적이면서도 내적으로 공허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에는 무관심한 나라였다. 미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라는 말은 가당찮은 주장이지만, 미국 사회가 유달리 천박하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스케일이 크고 풍요롭고 더 복합적이고 더 극단적이긴 하지만 좋은 얼굴과 한심한 얼굴이 병존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모든 사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도 미국 중심의 세계관에 빠지면 미국을 대체로 긍정적으로만 보거나, 추악하게만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때 몇 가지 폐단이 생긴다. 첫째, 미국만을 유일한 국제무대이자 세계로 보게 된다. 둘째, 미국이라는 패러다임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비판을 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식으로 비판한다. 셋째, 좌우를 막론하고 현실주의적 정치관에 동의한다. 초강대국의 해석틀 안에 이상주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넷째,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굴에 들어간다는 논리가 통용된다. 자식 교육만큼은 미국에서 시키고 싶어 하고,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서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부처님을 비판하는 손오공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미국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미국 사회를 상대화해서 보지 못하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미국 중심형 숭미, 미국 중심형 반미 오류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앞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을 계속 비판하면서도 미국 사회 자체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다양한 세계 사회에 속한 하나의 구성원일 따름이다. 이런 수평적 자세만이 한국인이자 세계인으로서의 내 자존심과 주체성을 의연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다.
조효제/하버드대 로스쿨 인권펠로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