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13 21:29
수정 : 2018.06.13 21:51
김현경
문화인류학자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다 보면(숙제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다) 한국의 학교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지난주에 아이가 받아 온 숙제는 대공황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수행평가라는 이름으로 이런 숙제를 많이 내준다. 아이가 지난 두 달 동안 만든 파워포인트만 해도 10개가 넘는다.(덕택에 아이의 미술 실력이 쑥쑥 늘고 있다.) 이런 숙제를 내주는 교사들은 대공황이나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교사 중심’의 교육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고, 평가도 ‘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과연 이분들은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숙제를 해 가는지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런 숙제를 받은 아이들은 보통 네이버에 접속해서 문제의 단어(대공황, 차티스트 운동 등등)를 검색창에 친다. 그러면 위키백과, 나무위키, 그리고 누군가가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놓은 수십개의 토막글이 뜬다. 아이들은 이 중에서 쉬워 보이는 것을 몇 개 읽고 대공황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적당히 편집하여 파워포인트를 만든다. ‘저작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않는다. 인터넷을 떠다니는 정보 중에는 부정확하거나 너무 낡은 것, 인종적, 성적, 문화적 편견을 담고 있는 것도 많다.
나는 아이에게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을 아무거나 긁어 오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권의 책에서 대공황에 관한 대목을 찾아주었다. 그 책들은 사실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먼저 대공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고 책을 읽게 했다.(사회과학을 전공한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숙제를 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잔뜩 쑤셔넣는 것보다는 하나의 주제라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탐구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대학에 갔을 때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대학에서 나는 아주 똑똑하고 발표력도 뛰어나지만 대학생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사실들을 모르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1차대전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거나, 서인도 제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식이다.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은 특정한 주제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소홀히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런 공백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많은 학생들이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에서 긁어 온 것을 짜깁기해서 보고서를 쓰는 데 익숙해져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줄 때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인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각주는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먼저 가르친다. 남의 것을 베끼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밴 학생들을 보면 차라리 고등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 온 수행평가 숙제 중에서 제일 내 마음에 든 것은 ‘윤동주 시 여섯 편 외워 오기’였다. 이 숙제는 엄마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었다. 암기만큼은 오롯이 자기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멋진 것은, 숙제를 하고 나서 아이가 시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이 방 책꽂이에 주말에 친구와 서점에 같이 가서 골라 온 시집이 몇 권 꽂혀 있다. 암기식 교육이 꼭 나쁜 건 아니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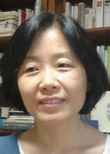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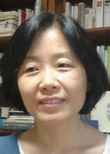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