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15 23:27
수정 : 2006.06.15 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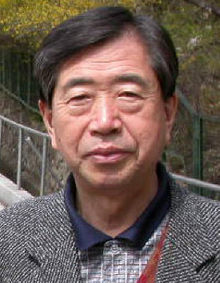 |
|
김태준 동국대 명예교수 국문학
|
기고
지난 5월26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지켜보며, 법만 있고 법 정신이 결여된 유죄 판결에 대하여 서글픔을 감출 수 없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사문화한 구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머지않아 기필코 실현될 수밖에 없는 조국 통일과 역사 진보를 향한 양심적 학자의 학문에 족쇄를 채우는 현실에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우리 정부는 탈냉전 통일시대의 민족사적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제정하고, 남북한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정부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6조 1항)고 명시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경제 공동체 구현, 민족 동질성 회복, 북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재정상의 조처(6~12조) 등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신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진보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벌써 폐기된 악법이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웅변하는 사실인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는 정치판의 직무 유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양심적 진보적 사학자의 학문을 정죄하는 사법부의 수구적 구시대적 비양심에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강 교수를 단죄한 법률의 근거가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라는 데서는 더욱 한심하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교수가 학문적 소신과 논문 때문에 학교로부터 신분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중세의 대학에서도 그 보기가 별무한 일이다. 나의 모교이며 퇴임한 직장이기도 한 동국대학교는 올해가 설립 100돌로, 민족사학의 역사를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축제의 해를 맞고 있다. 이런 때 ‘동악’의 상징으로 만해 한용운의 시비가 선 교정에서 통일에 대한 학문적 소신이 직위해제의 수난을 받아서는 안 되며, 더구나 북한을 찾아 김일성종합대학과 교류를 하자면서 남북 화해를 앞장서서 부르짖는 집안 식구는 용서할 수 없다는 논리는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학문사상을 통일적으로 순수 배양해 온 오랜 역사를 가졌고, 이것이 우리의 학문과 사상의 다양한 발전을 가로막는 뼈아픈 역사를 가져왔다. 가깝게는 조선 후기에 사상과 정치의 일대 소용돌이를 몰고 온 이른바 ‘사문난적’이란 명분론이 시대를 지배한 바 있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과 사회 경제적 변동을 주자학 체계로서는 감당해 낼 수가 없어, 실천궁행을 목표하는 양명학이나 새로운 서양기술 문명에 주목하고 있었던 서학 등 외래학문을 받아들였다. 그런 가운데 새 시대사상의 꽃으로 실학과 같은 진보학문이 자랄 수 있었고, 뒷시대의 동학은 현실부정 사상과 평등사상, 민족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민중을 넓게 결집시키며 시대의 여명을 열어 주지 않았던가? 이런 사상사적 소용돌이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나 유배를 당했고, 수많은 천주교도와 동학의 민초들이 죽어갔으며, 진보는 뒷걸음질쳤다. 강 교수의 수난은 이런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김태준 동국대 명예교수 국문학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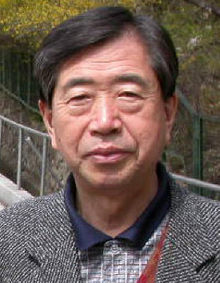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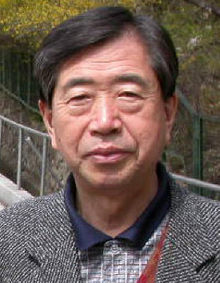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