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3.17 20:23
수정 : 2008.03.17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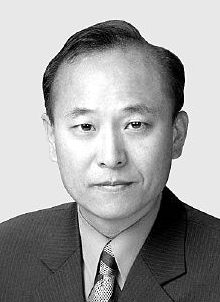 |
|
하우영/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기고
2008년 2월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그 아픔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3월 머나먼 미국 땅 텍사스의 어느 허름한 모텔 방에서 우리의 젊은 지식인들이 못다 핀 꿈을 접고 연이어 삶을 마감했다. 누구보다 촉망받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허무한 자살의 길로 내몰았는가? 학문이 좋아 스스로 학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토록 소망하던 대학의 강단에 섰던 그들은 왜 스스로 좌절과 절망의 경계선을 결국 넘고야 말았는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캠퍼스 구석구석에는 새날의 생명력이 용솟음친다. 새내기들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은 언제 보아도 싱그럽고 푸르다. 박차고 솟구치는 생명력의 함성이 가득한 캠퍼스에 이렇듯 허망하게 날아온 비보는 우리 대학인들을 참담하게 만들고 만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것이 그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3년 서울, 2006년 부산,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죽음이 있었고, 그때마다 시간강사들의 비참한 상황을 두고 재발을 우려하고 구체적 대안을 촉구했건만 아무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은 오늘도 속수무책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운다.
언론 보도대로 낮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서였을까? 정규직 교수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비관해서였을까? 물론 시간제 임금 책정과 그나마 1년에 넉 달은 한푼도 주지 않는 임금 체계가 최소한의 생계조차 잇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니다. 이땅에는 그들보다 더한 가난이 많고 감내하기 힘든 일상을 버겁게 살아가는 더 많은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진짜 이유는 대학사회에서 행해지는 철저한 소외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대학 강의를 40% 가까이 담당하며 강의와 연구에 정진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결코 교원이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시간강사의 굴레를 쓰게 되면 제도의 사슬은 천형처럼 그들을 옭아맨다. 교원 지위를 빼앗고,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주지 않은 채 철저히 배제한다. 많은 시간강사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렸고, 학문에 대한 열정마저 차단당하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루살이 인생만큼이나 소외받는 그들의 영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식인들의 자화상이며 한국 대학의 현주소다. 가난함과 배고픔은 견딜 수 있으나 학자의 본분을 방해받거나 자존심마저 훼손당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 본인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주당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뀐 대학 쪽의 강의 배정 통고는 그에게 어떤 무게로 작용했을까? 시간강사가 아니면 그 절망을 결코 짐작하기 어려우리라. 정규직 교수는 의무 강의시간이 주당 9시간이다. 주당 24시간을 강의한다는 것은 연구하고 논문 쓸 시간을 몽땅 빼앗긴다는 의미다. 학자의 열망을 거세당한 그 순간 그가 느꼈을 절망이 전해지지 않는가?
이제 더는 대학의 시간강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비인권적인 대학강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학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대학은 재정문제를 핑계 삼아 대학강사를 착취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젊은 지식인들을 강의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길이고, 우리의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며,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하우영/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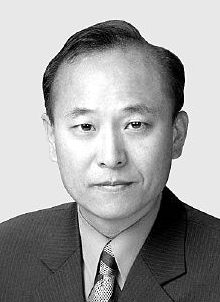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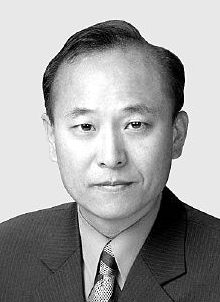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