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5.31 21:15
수정 : 2006.06.23 10:48
‘춘권’ 기막힌 맛 묘사하고픈 욕망이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잡지사에 다닌 적이 있다. 나의 임무는 요리와 와인과 맛집을 취재하고 그 맛을 글로 써내는 것이었는데, 이건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일이었다. 음식의 맛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폭탄을 제조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고, 마감에 맞춰 원고를 토해내는 일은 폭탄이 터지기 1초 전에 적진에서 탈출하는 것보다도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미션이 임파서블할수록,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음식의 맛을 묘사하는 것이야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 식당의 서비스를 설명하거나, 주방장의 철학을 길게 설명하는 것으로 지면을 메워나갔다. 잡지사의 편집장이 소개해 준 압구정동의 중식당 ‘목란’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목란’에서 가장 먼저 맛을 본 요리는 춘권(春捲)이었다. 방금 춘권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 맛과 향과 졸깃한 아삭거림이 다시 떠올랐다. 지금도 그 맛의 처음과 끝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곳저곳에서 춘권이라고 이름 붙여 놓은 음식을 먹어보았지만 ‘목란’의 춘권만큼 그 이름에 맞아떨어진 경우는 없었다. 깨물면 아삭거리는 껍질 속에서 채소와 고기의 부드러운 즙이 입안에 가득 퍼지고, 삼키면 뜨끈한 기운이 몸속 깊은 곳으로 스민다. 다 먹고 나면 혀와 입천장과 이 사이에 향긋한 얼얼함이 오랫동안 감돈다. 춘권을 먹고 ‘목란’을 나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이 맛을 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미션 임파서블일 게 분명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맛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다.
그날 이후 나는 수시로 ‘목란’을 찾았다. 어떻게 하면 음식의 맛을 글로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투철한 기자 정신 때문이었다기보다는 ‘목란’의 음식들을 하나둘 섭렵해 나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이라는 프랑수아 트뤼포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목란’의 음식들을 먹고 또 먹었다. 춘권은 늘 맛있었고 - 그중에서도 춘권 피를 갓 만든 날의 맛은 까무러칠 정도였다 - 소리로 한번, 향으로 또 한번, 맛으로 다시 한번 사람을 감동시키는 해물누룽지탕의 맛에도 점점 중독됐고, 그 어떤 닭요리보다도 부드럽고 차진 궁보기정의 새로운 맛도 배웠다. 모든 요리에는 불 맛이 살아 있었고 주방장의 마음이 살아 있었다.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재료와 주방장의 마음이 화학반응을 일으킨 결과물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란’은 음식점이 아니라 학교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란’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그리운 음식은 ‘회오리볶음밥’이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촉촉한 볶음밥보다 밥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서 곤두서 있는, ‘드라이한’ 회오리볶음밥이야말로 이 집의 장기다. 볶음밥을 만드는 내내 밥 알갱이가 웍(wok, 중국요리용 냄비)의 가장자리를 회전하게 만들어야 불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법인데, ‘목란’의 볶음밥이 바로 그렇다. 볶음밥 한 숟가락을 입안에 넣으면 작은 생명체들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회오리볶음밥을 먹을 때는 큼지막하게 썬 대파와 두반장을 함께 시켜 먹어야 한다. 두반장과 대파 연합군의 공습을 받은 후에는 한동안 양파와 단무지를 입에 댈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목란: 02-517-0052. 압구정역 4번 출구로 나와 60미터 걸어가다 빛마을 길로 오른쪽으로 돌아 20미터 더 걸어가면 왼쪽에 있다.)
|
|
소설가 김중혁(36)씨의 맛집 칼럼 ‘달콤한 끼니’를 격주로 매주 목요일 연재합니다. 김씨는 최근 내놓은 소설집 〈펭귄 뉴스〉에서 개성 있는 문체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주목을 받았고, 2003년부터 1년 동안 맛집 관련 잡지인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기자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는 “정보가 너무 많은 글보다는 감성적으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
|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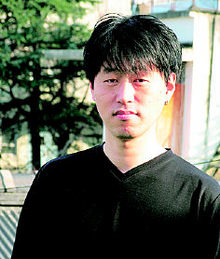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