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3 05:59
수정 : 2019.12.13 18:55
[책&생각] 정인경의 과학 읽기
존엄하게 산다는 것게랄트 휘터 지음, 박여명 옮김/인플루엔셜(2019)
독일의 저명한 신경생물학자 게랄트 휘터는 <존엄하게 산다는 것>에서 과학적 관점으로 인간의 존엄을 조명하고 있다. 그가 이 책을 쓴 계기는 우리 시대에 존엄하지 않은 삶을 곳곳에서 목격해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며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데 무감각하고 거리낌이 없다.
존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세계 인권선언에도 등장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자신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왜 그럴까? 존엄이 무엇이길래,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인가? 이 책에서는 존엄을 인간에게만 주어진, 인간 뇌의 조직과 기능 방식에 있는 ‘내적 표상’이라고 정의한다. 신경과학의 전문 용어인 표상은 뇌의 신경세포에 축적된 정보의 패턴을 말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세계를 내면에 표상한다. 예컨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지각과 경험을 통해 개와 고양이라는 표상을 내면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자의식이 대표적인 내적 표상이고, 존엄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왜 인간은 존엄이라는 내적 표상을 갖게 되었을까?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근거로 존엄은 생명체가 엔트로피, 무질서도를 낮추고 스스로 질서를 세우려는 자기 조직화의 노력이다. 이렇게 인간의 뇌는 자기 보존의 감각을 타고났다. 하지만 존엄이라는 내적 표상이 저절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 감정, 행동을 이끌어내는 신경세포의 연결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변적이고 개방적인 인간의 뇌는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 인간다움과 존엄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책은 신경과학과 발달심리학, 복잡계 물리학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존엄의 실체를 증명한다. 존엄은 살아가는 동안 뇌 안에서 신경망 패턴의 형태로 저장된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과 결합해서 삶을 지탱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이루는데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의 힘으로 터득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한 사람은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타인의 존엄하지 않은 행동에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게랄트 휘터는 독일 연방헌법 1조, 1항의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말이다.
“존엄함이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하는 방법, 인간이 인간을 위해 책임지는 태도의 문제다. 얼마나 존엄한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제 그만 타인의 존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멈추자.
과학저술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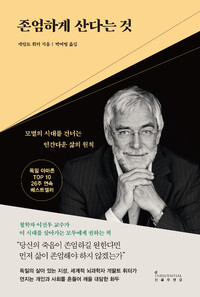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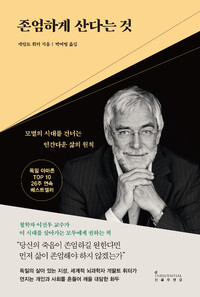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