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22 20:33
수정 : 2018.03.22 21:01
양경언의 시동걸기
이근화, ‘탄 것’
<내가 무엇을 쓴다 해도>(창비, 2016)
‘애타다’는 말이 있다. ‘애’는 과거에 ‘창자’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요새는 쓰이지 않고, 몹시 답답해서 속이 절절 끓을 때 쓰는 ‘애타다’와 같은 말에서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창자가 탈 정도의 답답함이라니. 그런 사람의 속이 속일까 싶어 ‘애타다’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그 말을 듣는 내 심정도 타들어가는 것 같다.
‘탄다’는 말은 자극적인 상상을 남긴다. 무언가 타는 상황은 타고 있는 그 무엇이 두번 다시는 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리고, 사라져가는 원형의 자리엔 그을음과 특유의 맵싸한 냄새만이 남겨질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는 어떤가. ‘애가 타는’ 심정도 그을음과 맵싸한 냄새를 남기나. 혹은 그을음이나 맵싸한 냄새 없이도 애타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만 발을 굴리고 있나.
다음 시에선, 원래 있던 자리에서 나던 냄새 위에 ‘탄’ 냄새가 더해지면서 주어진 상황을 이전과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 이의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이 시에 등장하는 ‘탄 것’은 단지 청주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생선 꼬리지느러미”나 토스터기에서 “새까맣게 탄” “식빵”만으로 읽히지 않는다.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방식을 뒤바꿔버린 ‘애타는 심정’의 다른 형상 같다.
“봄 날씨가 꽤 쌀쌀했고 으슬으슬 떨렸다. 일본식 주점에 가서 청주 한잔을 주문했다. 생선 꼬리지느러미를 태워서 잔 위에 띄워왔다. 찬물 한바가지에 띄운 꽃잎도 아니고 어리둥절했다. 부드럽고 우아한 맛을 기대했으나 태운 지느러미 때문인지 누린내가 났다. 청주의 비린내를 지느러미로 잡으려는 것일까. 알 수 없는 마음으로 홀짝였다. 얼굴이 금세 달아오르고 손발이 점차 따뜻해졌다. 마음은 심해를 누비는 어류의 것이 되었다. 물의 냄새는 물 바깥의 것이어서 나의 코는 간단히 사라지고.// 북쪽 창 벽면에 응결이 지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몇 해 방치했더니 점점 심해졌고 곰팡내가 나기 시작했다. 벽에 먹물을 흩뿌린 듯했다. 검은 꽃이라면 꽃이라 할 수도, 부엌에 면한 곳이니 날마다 조금씩 나눠 마시고 있는 것인지도. 어느날인가 토스터에서 식빵이 새까맣게 탄 적이 있다. 허기와 탄내가 진동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곰팡내가 줄어들었다. 알 수 없는 마음으로 입맛을 다셨다…(중략)…// 마음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이들이 있다. 마음을 먹고 쑥쑥 자라는 입 없는 몸들이 있다. 발이 부어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내 코가 그들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냄새의 강자들이 내 코를 가볍게 무너뜨리는 순간까지.”(이근화, ‘탄 것’ 부분)
이 시의 놀라움은 애타는 심정을 “가부좌를 틀고 앉은” 모습으로 또는 “발이 부어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를 견뎌내는 모습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를 결국 자신 삶의 일부로 구성하려는 시인의 성숙한 태도에서 온다. 애타는 심정마저 끝까지 성찰하려는 저 지독한 책임의 자세. 꽤 쌀쌀한 요즘 같은 날씨에, 성찰하는 방법을 잃고 부끄러움마저 모르게 된 이에게 전하고픈 문학의 태도가 여기에 있다.
양경언 문학평론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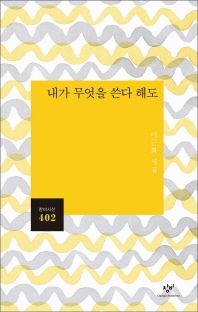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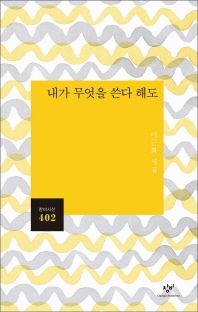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