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30 06:02
수정 : 2018.11.30 19:38
[책과 생각] 양경언의 시동걸기
‘그리고 미소를’폴 엘뤼아르 시집 <이곳에 살기 위하여>(오생근 옮김, 민음사, 2013)
일본의 세계적인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가 암 진단을 받은 뒤 그 이전까지의 구상을 접고 새로운 작업에 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스티븐 쉬블 연출, 2017)의 한 장면을 쉽게 잊지 못하겠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쓰나미로 인해 황폐화된 지역에 직접 찾아갔을 때 버려져 있던 피아노를 발견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피아노는 언제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입었냐는 듯 태연하게 (이제는 인적이 드문 곳이 되어버린) 강당 앞에 서 있는 듯했지만, 류이치 사카모토가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미 많이 망가진 뒤였다. 곳곳에 흉이 져 있었고, 건반 역시 성할 리 없었다. 재난이 일어났던 당시 물에 잠긴 채 둥둥 떠 있다가 강당을 채웠던 물이 빠져나가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리라고 추측되는 피아노 앞에 선 사카모토는, 그것을 골똘히 쳐다보다가 “잘도 버텨냈”다고 한마디를 하더니 건반 위에 손을 올린다. “익사한 피아노 송장을 연주하는 기분”이 든다면서 조율이 엉망인 건반을 누르다가 그는 문득 ‘쓰나미에도 살아남은 피아노’의 소리가 자연이 조율한 소리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한다. 그 피아노는 인간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소리에 억지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힘에 의해 사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던 것이다.
피아노의 망가진 상태를 악기로서의 가치 상실로 여기지 않고 사물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찾아가는 중이라 여기는 그의 시선은, 암 투병 중에 삶의 마지막을 가늠하게 된 그가 “언제 죽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것을 남기기 위해” 병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선을 다시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과 겹쳐 있다. 재난 속에서 살아남은 피아노 이야기는 재난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속되어야만 하는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셈이다.
살면서 삶의 일부가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영영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 짓거나 완전히 고쳐내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시작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종착지가 아닌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정의 출발지로 여기는 것,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삶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밤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슬픔의 끝에는 언제나/ 열려 있는 창이 있고/ 불 켜진 창이 있다/ 언제나 꿈은 깨어나듯이/ 충족시켜야 할 욕망과 채워야 할 배고픔이 있고/ 관대한 마음과/ 내미는 손 열려 있는 손이 있고/ 주의 깊은 눈이 있고/ 함께 나누어야 할 삶/ 삶이 있다”(폴 엘뤼아르, ‘그리고 미소를’ 전문)
2018년을 한달 남짓 남기고, 나는 프랑스 시인 폴 엘뤼아르의 시에서 “밤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에 천천히 손가락을 대본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캄캄함이 캄캄함 그 자체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면 캄캄한 한가운데서도 다시 창을 열고, 다시 불을 켤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으리라 여기면서.
양경언 문학평론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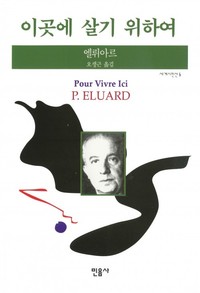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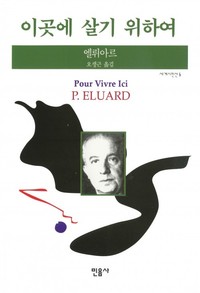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