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22 20:31
수정 : 2018.03.23 10:09
<기업소유권의 진화>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북돋움(2017)
주주총회 시즌이다. 23일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이다. 전체 12월 결산 상장사의 28%인 539개사가 이날 주총을 개최한다. 당국은 한 날에 몰아서 주총을 열면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가 어렵다고 보고 분산개최를 유도하지만 관행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 같다.
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화한 ‘주주자본주의’는 주주를 노동자, 납품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앞에 배타적으로 자리매김한다. 회사가 청산되면 주주는 은행 등 채권자가 챙겨간 뒤 남은 것을 받는 ‘잔여적 청구권자’이기에 위험에 상응한 권리를 누린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경제의 ‘금융화’가 진행된 80년대 이후에는 단기차익에 관심이 있는 유동적인 주주가 많아졌다. 회사의 중장기 비전이나 경영방침은 관심권 밖이라는 얘기다.
<기업소유권의 진화>에서 법경제학자인 헨리 한스만은 노동자 소유기업, 소비자 소유기업, 비영리 기업 등 시장경제에서 잘 운영되는 다양한 소유형태를 점검하면서 주식회사(투자자 소유기업)를 당연시하거나 이상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실제 주식회사의 천국일 것 같은 미국에도 소비자 소유기업이나 노동자 소유기업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한스만은 어떤 산업분야에서 특정한 기업 형태가 지배적으로 되는 이유를 ‘비용 최소화’라는 이론틀로 설명한다. 한 기업은 자본 투자자, 원료 공급자, 노동자, 소비자 등 ‘이용자’(patron)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 이용자는 그 기업과 ‘시장계약 관계’나 ‘소유관계’ 중 하나의 관계를 맺게 된다. 시장계약 관계에서는 시장계약비용이, 소유관계에서는 소유비용이 발생한다. 한스만의 주장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기업과의 관계에서 두 비용의 합이 최소화하는 조직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산물 유통회사가 한 곳뿐이어서 생산자인 농민이 가격동향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판매자에 휘둘리는 일이 빈번해지면, 농민들은 이 유통 회사를 소유함으로써 독점에 따른 시장계약비용을 낮추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이때 ‘소유’는 이사진 선임 등 공식적 의사결정권과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잉여수취권 등 두 가지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이때 더 고려할 것은 나머지 비용, 즉 소유비용이다. 경영진을 세우고 감독하는 비용, 농민들이 모여서 회사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비용 등이다. 만일 소유비용이 크지 않다면 농민은 자금을 출자해 농협 같은 협동조합 회사를 만들게 된다.
이용자 중 누가 기업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기업 형태가 결정되는데, 자본 투자자가 소유하면 주식회사, 노동자가 소유하면 노동자협동조합, 원료 공급자가 소유하면 생산자협동조합이 된다. 이렇게 보면 주식회사도 별 것이 아니라 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 선택된 ‘투자자들의 협동조합’ 이라는 것이다.
“협동조합 그것 사회주의 하자는 것 아닙니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논의 자리에서 정부 부처에서 나온 한 간부가 했다는 말이다. 이젠 법 시행 5년이 지나 1만3000여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취약계층의 자활 등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협동조합과 이것이 포함된 사회적경제에 대해 ‘사회주의’, ‘좀비’ 운운하는 공격이 남아있다. 상황이 이렇기에 주식회사에 대한 한스만의 이런 시각은 신선하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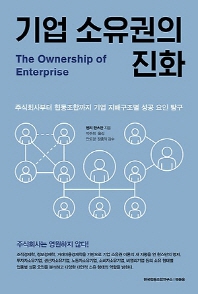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