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09 06:02
수정 : 2019.08.09 20:36
자금성의 노을-중국 황제의 후궁이 된 조선 자매 서인범 지음/역사인·2만4000원
사대의 기본은 조공이다. 조선 팔도의 진귀한 특산품이 ‘섬김’의 표시로 명나라로 건너갔다.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명 3대 황제인 영락제 때 궁녀로 삼을 젊은 조선 여성과 환관으로 쓸 화자(고자)를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황제가 여자를 찾으면 조선에는 비상이 걸렸다. 공녀 선발을 위한 관청 ‘진헌색’을 설치하고 전국에 금혼령이 떨어졌다. 딸을 숨기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했다. 조선에 들어온 명의 환관이 황제의 대리인 자격으로 본국으로 데려갈 여자들을 엄선했다.
성종 때까지 명에 보낸 공녀는 114명. 16명이 후궁이 됐는데 이들 중 자매도 있었다. 지순창군사 한영정의 큰딸 여비(성명 불상)는 태종 17년(1417년) 명으로 건너가 영락제의 후궁이 됐지만 세종 6년(1424년) 황제가 죽자 순장을 면치 못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여비의 동생 한계란이 이번엔 영락제의 손자 선덕제의 공녀로 선발된다. 앓아누운 여동생에게 오빠 한확이 약을 건네자 한계란은 이렇게 말한다. “누이 하나를 팔아서 부귀가 이미 극에 달했는데 무엇 때문에 약을 가져왔습니까.”
한계란의 북경행은 비극적인 뉴스였다. 사람들은 그를 “산송장”이라고 부르며 땅을 쳤다. 그러나 한계란은 1435년 선덕제 사망 뒤에도 예상과 달리 삶을 이어갔다. 뛰어난 암기력을 인정받아 정통제·경태제·성화제 시절 궁궐 살림을 책임지며 73살, 천수를 누리고 눈을 감았다. 역사학자 서인범의 책 <자금성의 노을>은 명나라에 바쳐진 뒤 황제의 측근이 돼 때로는 조국을 위하고 때로는 민폐를 끼치며 살다간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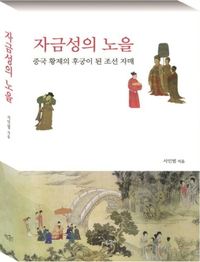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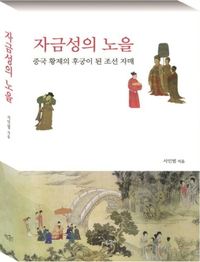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