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자 장회익의 ‘동양-서양’ ‘과학-철학’ 핵심 탐구
이황 성학십도, 곽암 심우도 결합한 ‘심학십도’로 설명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철학을 잊은 과학에게, 과학을 잊은 철학에게 장회익 지음/청림출판·2만2000원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 물속의 거품을 모두 태워버렸네. 우습다, 소를 탄 사람이여 소의 등에 타고서 다시 소를 찾는구나.”(斫來無影樹 銷盡海中? 可笑騎牛者 騎牛更覓牛)
장회익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가 최근에 펴낸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의 여는 글에선 <심우도>(또는 십우도)에 대한 서산대사의 선시가 소개되어 있다. 이는 서산대사의 열반시로 알려진 “팔십년 전에는 그대가 나더니 팔십년 후에는 내가 그대구나”(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를 떠오르게 한다. 이 시가 바로 장 교수가 말하는 심학 10도가 묘사한 ‘온전한 앎’에 이르는 과정과 상황을 읊은 것이 아닐까?
장 교수의 폭넓은 학문 수련과 깊은 사색의 산물인 이 책은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배움으로서 먼저 앎의 바탕 구조를 설명하고, 물리학의 방법으로서 고전역학, 상대성이론, 양자역학과 통계역학을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와 물질, 생명 현상에 걸쳐 물리학의 정수를 소개하고, 나아가 주체와 객체, 그리고 앎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철학의 본원적 핵심을 펼쳐 보여준다. 그는 이러한 논의를 서구에서 형성된 과학과 함께 동아시아의 전통 인문학을 바탕으로 펼쳐 나간다. 특히 책을 열 장으로 나누어서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와 곽암의 <심우도>로부터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심학십도’라는 틀에 맞추어 기술한 시도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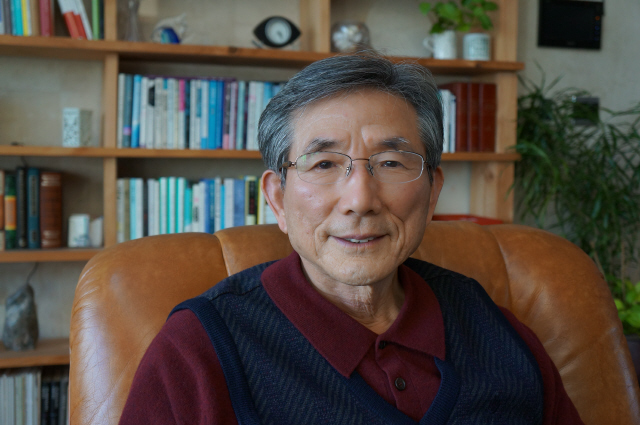 |
|
지난 2016년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던 당시의 장회익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사진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
소를 찾아 나서는 첫 여정인 1장에서 여현 장현광(1554~1637)의 <우주설> 및 <답동문>에 나타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앎의 바탕 구도를 살펴본다. 다음 2장에서 5장까지 소의 자취를 보고 나서 실제 소를 보고 얻어서 치는 여정에서 데카르트와 뉴턴에 의한 고전역학,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4차원 시공간과 상대성이론 형성, 슈뢰딩거를 비롯한 20세기 전반 물리학자들의 양자역학 구축, 그리고 볼츠만의 엔트로피 개념과 통계역학 등 서구에서 만들어진 과학이 그 내용을 어떻게 채워왔는가를 알아본다. 6장과 7장, 곧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서 소를 잊는 여정에서 우주와 물질, 그리고 생명을 탐구해가는 서술 방식은 읽는 이의 무릎을 치게 한다.
나아가 사람도 소도 모두 잊고, 본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인 8장과 9장에서 객체에 더해서 의식의 떠오름에 이어 주체의 출현을 탐사하고, 앎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삶과 앎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제시하며 묘한 경외감마저 느껴지게 한다. 거리의 가게, 저잣거리에 손을 드리우는 마지막 여정으로서 10장은 이러한 결과들을 주돈이의 <태극도설>의 구도와 비교한다. 전통 학문의 뿌리와 둥치에 서구 학문을 접붙여 키운 후 우리의 풍토에서 결실을 맺게 하려는 취지라는 저자의 설명이 마음에 와 닿는다. 결국 학문이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고, 인간과 사회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특별히 관심을 끈 부분은 우리의 학문 전통 안에서 고전과 근대를 나누는 시도다. 그는 <우주설>과 <답동문>이 이치를 추구하는 방법론과 인식론을 다루면서 합리적인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구성 물질의 개념과 이러한 존재물의 관찰로부터 그것에 적용되는 변화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논의는 구체적인 특정지식에서 출발하여 보편지식, 곧 일반적 법칙을 전개해가는 실제 물리학의 과정과도 부합한다. 더욱이 이렇게 얻어진 변화의 원리를 활용하면 그 존재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그것의 과거와 미래 상태를 얻어낼 수 있다는 지적은 역학법칙을 이용한 예측이라는 물리학의 본성과 일치한다. 서구 과학에서 전형적인 설명 방식으로 여겨지는 변화의 원리, 곧 역학법칙과 이를 이용한 예측을 동아시아 학문의 전통에서 찾아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관점이 돋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제시하려는 견해는 ‘일원이측면론’인 듯하다. 데카르트와 대비되는 스피노자의 견해가 구체화되고 깊어졌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객체이면서 동시에 마음 또는 정신을 지닌 주체로서 인간을 해석한다. 이러한 상황을 “둘이 아닌 하나이면서 두 측면, 곧 밖과 안을 지녔다”고 표현하며, 뫼비우스의 띠로 형상화한 논의도 흥미롭다. 이에 따라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연에 대한 사고를 통해 자연의 기본원리를 파악하고, 객체의 측면인 자연의 기본원리를 통해서 객체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결국 주체와 객체가 연결되어 뫼비우스의 띠가 완결되며, 이러한 ‘온전한 앎’의 과정을 그려낸 ‘심학 10도’는 이 책의 결론을 잘 보여준다.
덧붙여 전문적인 물리학 서적은 아니지만 곳곳에 새로운 물리학적 관점과 해석을 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로서 먼저 양자역학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들 수 있는데 저자가 오래전부터 제안한 ‘서울해석’에 더해서 4차원 복합공간의 바탕에서 양자역학을 얻어내는 방법은 4차원 시공간이 양자역학 체계 자체의 성격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또한 앎의 전형으로서 동역학의 구조에 대한 메타이론을 논의하고 “앎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심학 9도’도 흥미롭다. 그 밖에 광합성에 관련해서 빛알의 에너지 전달이나 생명의 기원과 단위에 대한 독특한 관점, 곧 자체촉매적 국소질서와 온생명 개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쉽게도 이 책은 어렵다. 방대한 관점과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요한 지적 성취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수학적 표현도 사용하였으므로 제대로 읽으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할 듯하다. 아울러 양자역학을 보는 새로운 관점과 우주의 진화나 생명의 기원 서술에서 간혹 확립되지 않은 추측이 제시되는데 읽는 이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워낙 방대해서 가볍게 읽다가는 논점을 놓치고 전체 핵심을 잡아내기 어려우리라 우려된다.
 |
|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최무영 제공
|
결론적으로 이 책은 동서고금문리, 곧 동아시아와 서구, 옛것과 새것, 그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아마도 세계 유일의 저서이다. 넓은 분야에 걸쳐 논의를 단순히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잘 어우러져서 통합적 사고의 중요한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통합학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모색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삶과 앎을 깊고 정확한 과학을 바탕으로 고찰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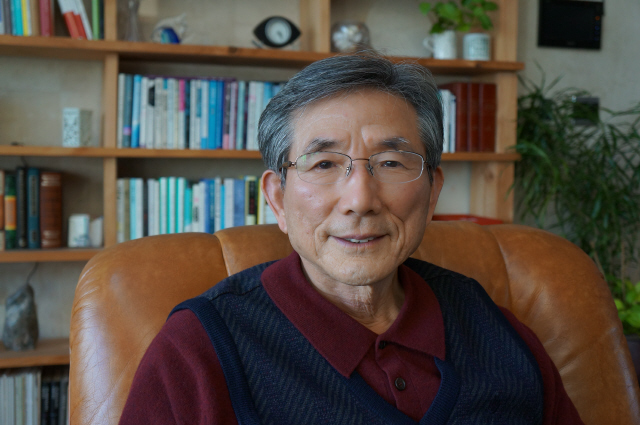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