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첫 자전소설 ‘남중’ 낸 하응백 문학평론가
 |
|
문학평론가 겸 출판인 하응백씨가 17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첫 소설이자 자전적 작품인 <남중>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여든세 살 할머니가 새삼 ‘시집’을 가겠다고 한다. 아니,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겠단다. 상대는 전쟁 때 전사한 남편. 결혼 사흘 만에 군에 소집된 남편은 2년 넘게 전장을 누비다가 휴전협정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1953년 7월14일 전사했다. 워낙 경황이 없어 미처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터였다. 그렇게 60년 가까운 세월을 법적으로는 ‘미혼’인 상태로 지내 온 할머니가 뒤늦게 죽은 남편을 상대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학평론가 하응백이 처음 쓴 자전적 소설 <남중>(휴먼앤북스)은 작가 자신의 어머니가 실제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라 죽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는 이야기로 문을 연다. 작가를 지난 17일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출판사 대표이기도 한 아들의 도움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시킨 뒤 가정법원의 판결을 거쳐 부부관계를 인정 받은 어머니는 “고생했다. 잘난 아들 덕뿐에 시집도 가고…”, “애비야, 좋다. 살면서 이래 좋은 적은 없었다”라며 행복해한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은 기쁨에, 국가유공자 유족 자격으로 받게 된 보상금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한 것이리라.
결혼 사흘 만에 참전해 전사 남편과
83살 때 뒤늦게 혼인신고한 ‘어머니’
대구시장서 싸전·완구점 재물 모아
처첩 여럿 먹여살린 실향민 ‘아버지’
검열·필화·블랙리스트…작가 체험
독립된 이야기 세편 연작으로 엮어
“문학으로 위안받아 가족사 객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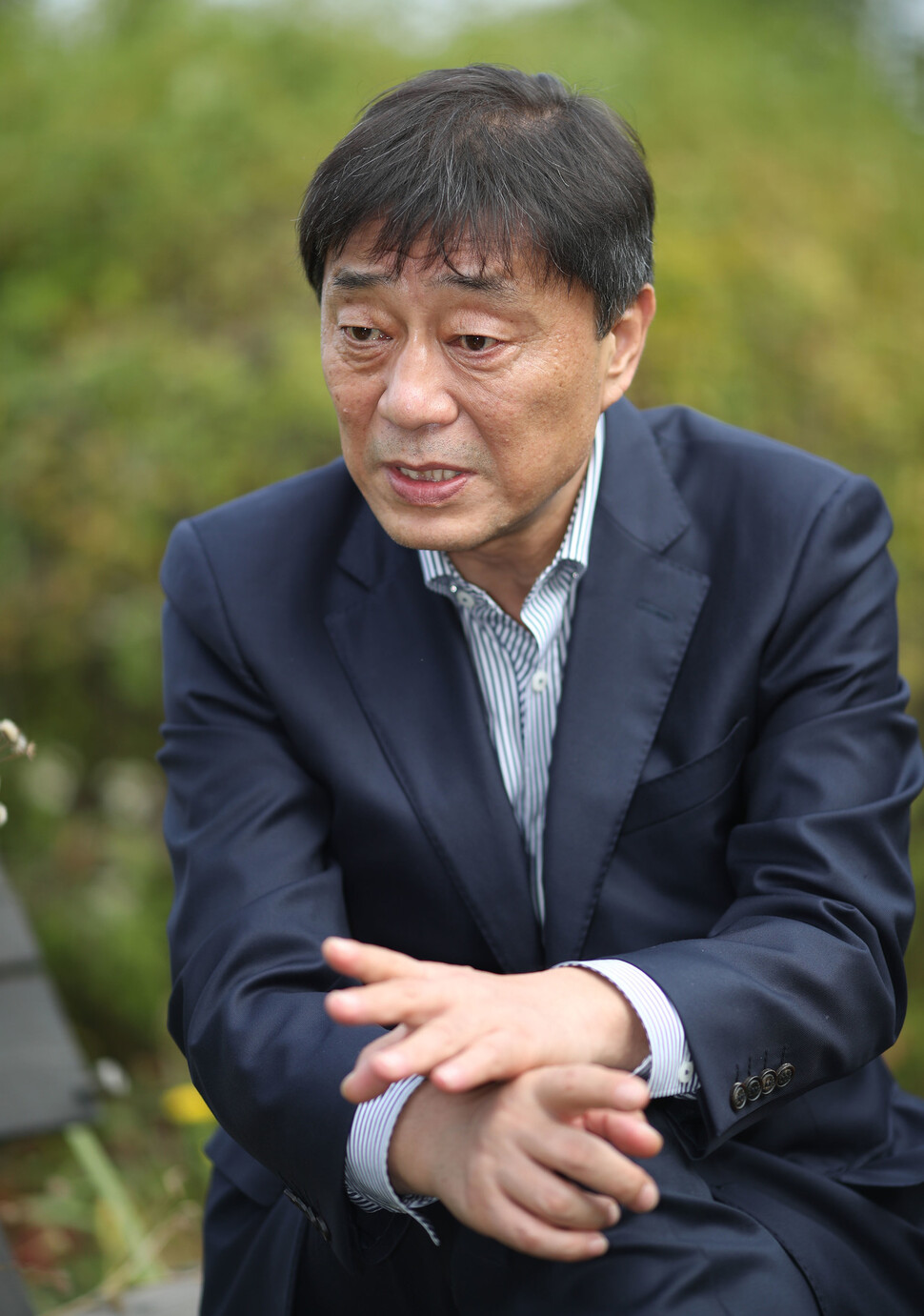 |
|
뒤늦게 소설가 이름을 얻은 하응백 문학평론가는 앞으로계속 소설을 쓸 작정이다. 사진 김봉규 선임기자
|
어머니는 남편의 전사 뒤에도 7년간 시집살이를 더 하다가 30살 때인 1958년에 독립했다. ‘싱거’ 미싱 한 대를 장만해 시장에서 한복을 지어 가게에 납품하던 어머니에게 어느 날 그보다 서른 살 많은 영감이 접근한다. “색시, 시장할 텐데 요기나 하러 갑시다.” 시장에서 커다란 싸전과 완구점을 경영하던 영감이었다. 이 영감과 ‘색시’ 사이의 소생이 <남중>의 작가 하응백이다.
“어려서는 그런 가족사 때문에 무척 힘들었죠.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그랬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소설을 읽다 보니 내 가족사의 특수성이 보편성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겠더군요. 내 가족사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소설의 재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처음 했어요. 문학이 그렇게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가족사를 객관화시킬 수 있었어요. 고교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문예반에 들어갔고, 대학도 별 고민 없이 국문과로 진학했죠.”
하응백은 박덕규와 안도현 등이 속했던 대구 대건고교 문예반 출신이고 경희대에 진학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고교 시절에는 수필을 주로 썼어요. 언젠가 가족사를 소설로 쓰겠다고 생각했지만,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평론가로 등단하고 하다 보니 소설에서는 멀어지게 되었죠. 사실 ‘남중’이라는 제목은 대학 때 이미 생각해 놓은 것인데, 책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네요. 하하.”
‘남중’(南中)이라는 제목은 천문학 용어로 사전에는 “천체가 자오선의 남쪽을 통과하는 일”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작가는 “태양이 당신 머리 바로 위에 위치한 순간, 우주적 질서 속에서 태양과 지구와 당신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절대적 순간”이라고 설명한다.
“이 자전적 소설의 주인공은 이른바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자존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 성장했든 자기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천체와 결합시킨 개념이 바로 ‘남중’인 것이죠.”
소설 <남중>은 세 편의 독립된 연작으로 이루어졌다. 첫 편이 어머니의 삶을 다룬 ‘김벽선 여사 한평생’이고, 둘째 편이 이북 출신으로 대구에 정착한 아버지의 행장기인 ‘하 영감의 신나는 한평생’, 그리고 마지막 편이 작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표제작 ‘남중’이다. 대구 시장통에서 어머니에게 ‘작업’을 걸어 인연을 맺은 아버지는 꽤 오랫동안 두 집 살림을 하며 어머니와 ‘나’를 경제적으로 챙겨 주었다. “지금 독자들 중에는 그런 ‘영감’의 행태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불가피한 시대상을 보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1899년생으로 197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작가는 이렇게 썼다.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과 조국분단의 시대를 다 겪으면서도, 남북을 주유하며 여러 처첩을 두셨고, 알려진 자식이 4녀 2남에다, 재물 또한 풍족했고 그 재물을 베풂에 인색하지도 않았으며 (…) 평생 호호탕탕 유유자적 사신 탓으로 걸리적거리는 직함 하나 애써 구하지 않아, 영감으로 호칭된들 그 어찌 부끄러움이겠는가.”
작가는 마지막 편 ‘남중’에서 대학 스승인 소설가 황순원, 대학 선배이자 80년대 벽두에 이른바 ‘한수산 필화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 받은 후유증으로 요절한 시인 박정만, 그리고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인 카프 소설가 김남천(1911~53) 이야기에 이어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으로서 겪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회고한다.
“문학이란 권력과 상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삶을 옹호하고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해 내는 게 문학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억누르는 반문학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제의 검열, 80년대의 필화, 그리고 최근의 블랙리스트 사태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연작소설들은 하나의 틀로 꿰어진다고 생각해요.”
<남중>을 쓰며 뒤늦게 소설 쓰는 재미를 느꼈다는 작가는 앞으로도 예술가가 등장하는 역사소설을 비롯해 계속 쓰고 싶다고 말했다.
“장르가 평론이든 에세이든 칼럼이든 모든 글쓰기는 본질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제가 평론가로서 비평한 작가들의 소설보다 더 읽을 만한가 하는 불안감은 있지만, 저만의 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미 없는 소설을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글 최재봉 선임기자 bong@hani.co.kr, 사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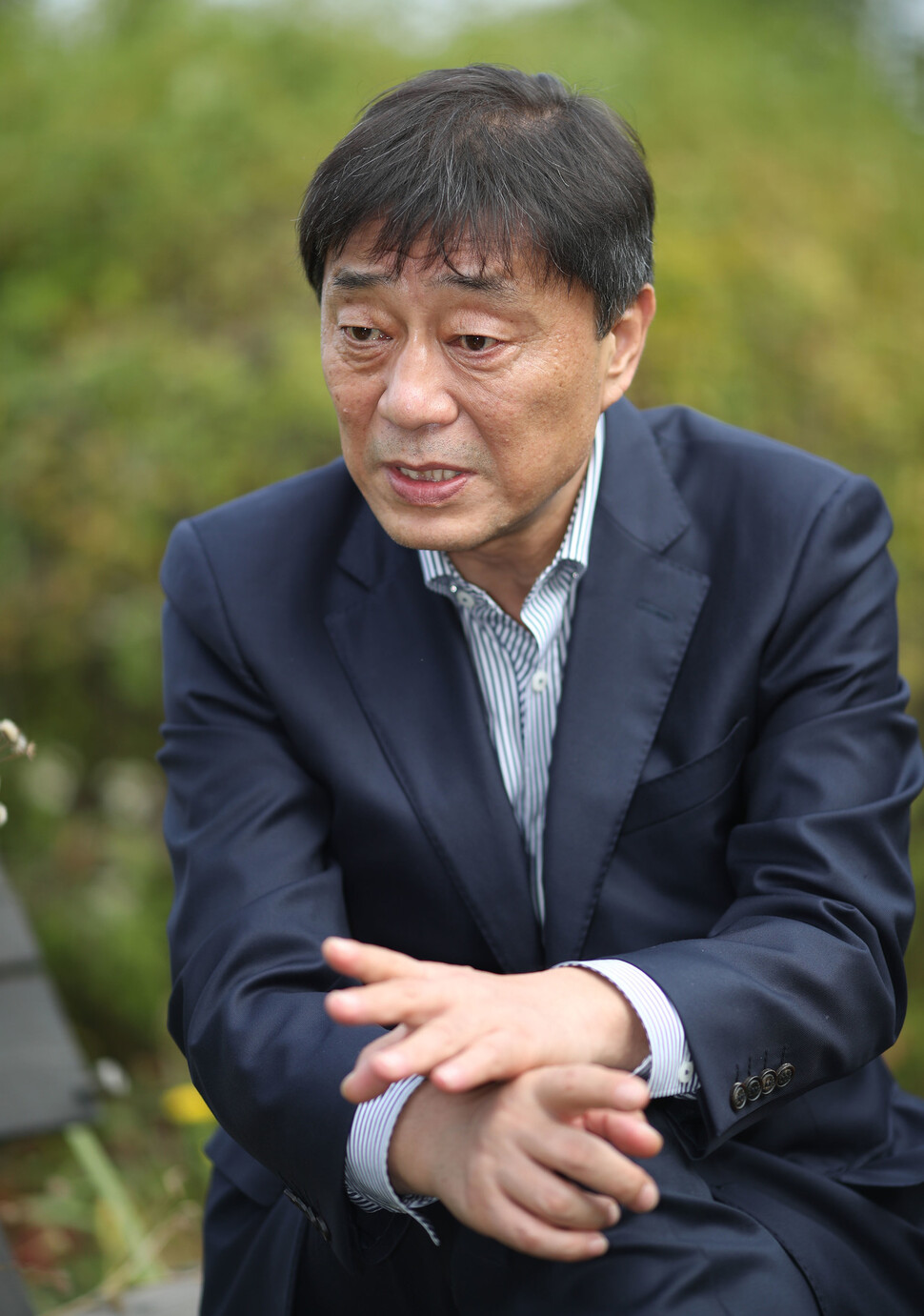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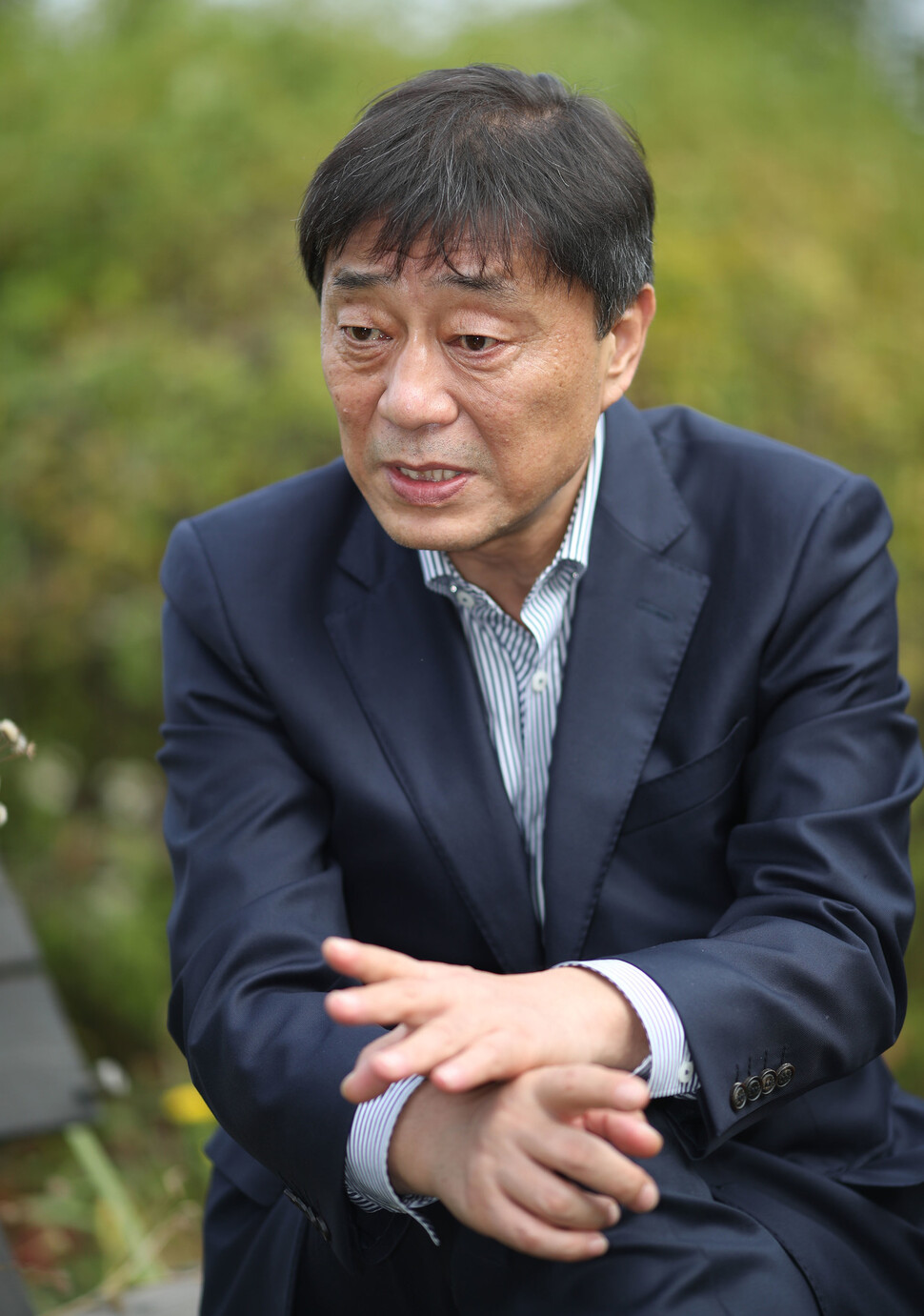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