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0 05:00
수정 : 2020.01.10 11:10
[책&생각] 정인경의 과학 읽기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
올리버 색스 지음, 김승욱 옮김/알마(2016)
1974년 올리버 색스는 노르웨이의 오지에서 등산하다가 큰 사고를 당한다. 젖소를 만나서 피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혼자서 부러진 왼쪽 다리를 끌고 내려오다가 순록 사냥꾼에게 발견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신경과 근육을 복구하는 수술을 받는다. 이렇게 신경 치유를 하는 3주 동안, 색스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깁스를 하고 있는 왼쪽 다리가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색스는 다리가 사라진 느낌을 받았고, 그 다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사고로 인해 단순히 신경과 근육만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의 결합까지 끊어져 근육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신경학에서 지각의 단절을 의미하는 ‘암점’이었다. 암점은 신경 병터에서 생성되는 의식의 격차로 ‘기억 구멍’이라고 한다. 왜 내 다리에 암점이 생겼을까? 색스는 이러한 현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려고 애썼지만 의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금껏 환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색스의 말을 무시했다. 신경의 단절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단절까지 겪으며 색스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환자 생활을 바탕으로 쓰인 책이 바로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이다.
이 책은 사고 당한 지 10년이나 지나서 1984년에 출간되었다. 그의 대표작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보다 1년 먼저 나온 작품이다. 하지만 이 책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의문을 갖고 연구했던 주제가 모두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색스는 환자의 경험과 느낌 같이,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개성을 만드는 ‘의식’(뇌의 작용)을 알고자 했다. 아주 사소한 개인적 사건부터 인류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인간은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에 직면한다. 그런데 누구는 고통을 극복하고 배움을 얻으며, 누구는 고통에 처참히 망가진다. 뇌가 어디까지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 색스는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파괴된 환자들을 통해 자신의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을 집요하게 찾아 나섰다.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에서 고통받는 환자는 자기 자신이다. 그는 놀랄 만큼 냉정하게 자신의 고통을 관찰한다.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화하는 작업은 마지막에 ‘이해하기’ 단계에 이른다. 이해하기는 자신의 고통을 돌보는 힘을 주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색스는 의사이며 연구자로서 다른 환자의 경험을 수용하고 암점의 정체를 밝히려고 시도한다. 그런데도 풀리지 않자, 1991년 개정판에서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제럴드 에덜먼의 신경 다윈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책은 “단순히 다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차적인 의식이 무엇인지를 털어놓는 내면의 이야기”라고 결론짓는다.
색스의 책을 읽노라면 고통을 겪는 과정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뜻깊은 성찰의 시간임을 알게 된다.
과학저술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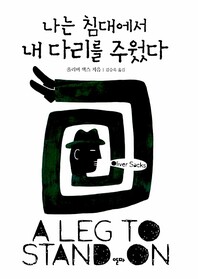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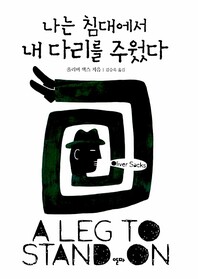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