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05 18:04
수정 : 2019.08.05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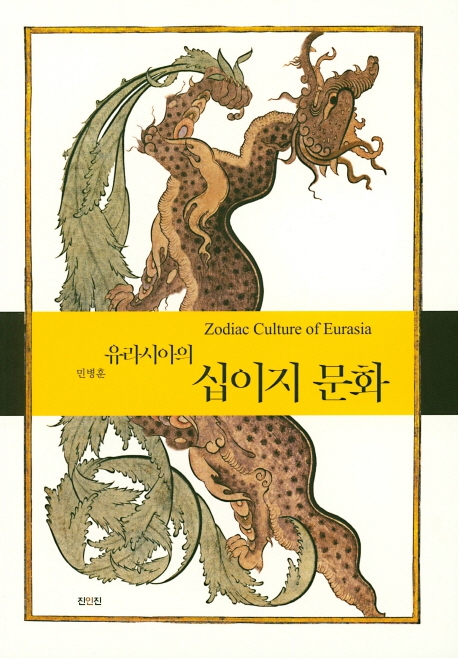 |
|
<유라시아의 십이지 문화> 표지
|
민병훈의 ‘유라시아의 십이지 문화’
도상 연원과 전파 과정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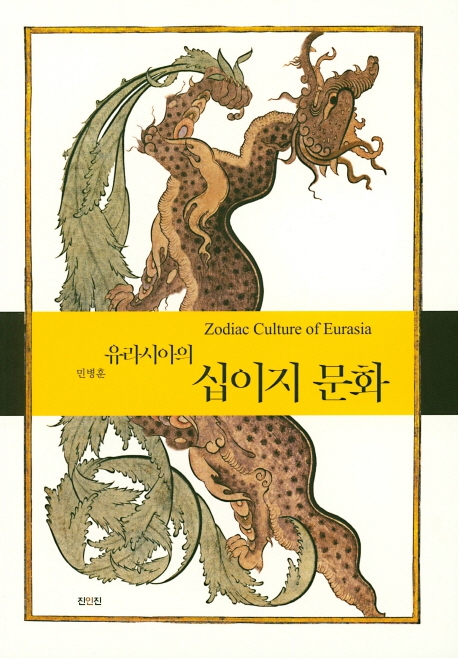 |
|
<유라시아의 십이지 문화> 표지
|
“혹시 무슨 띠세요?” “띠동갑인가요?”
처음 사람을 소개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물음을 꺼내는 사람이 많다. 한해를 상징하는 띠 동물로 대표되는 십이지 동물이 유라시아 각 지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상징화됐을까. 그 의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어떻게 전파됐는지 일러주는 책이 나왔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사 전문가로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을 지낸 민병훈(65)씨의 역저 <유라시아의 십이지 문화>(진인진 펴냄)다. 흔히 십이지 동물을 국내 설화 등의 민속자료에 한정해 생각하거나 한·중·일 전통문화로만 여기곤 하는데, 저자는 그런 인식이 편견임을 일러준다.
책을 보면 십이지 동물 문화는 별자리를 연구하는 기원전 5~6세기 고대 바빌론 천문학자들이 황도 12궁 개념을 만든 데서 기원해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다. 투르크·몽골인, 타이인들은 현재도 한국처럼 십이지로 연도를 쓴다. 지역마다 뚜렷한 차이는 있다. 동남아나 몽골, 인도, 아라비아 등에서는 일부 동물을 물소나 고양이, 표범, 악어 등으로 대체해 쓰고, 상징과 개념도 지역, 시기별로 다르다. 쥐를 한 손에 쥔 다문천이란 불교 호법신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재물과 복덕의 신이었다가 한반도와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나라 지키는 신이 됐다. 개의 경우 중국에선 송대 이후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천계의 동물로 퇴치 대상처럼 그림에 묘사됐으나 일본에서는 중세 이후 쉽게 출산하는 안산의 대명사이자 아이를 지키는 존재로 상징성이 달라졌다. 500쪽 넘지만 유라시아 변방에 흩어진 설화들과 파란만장한 문화사까지 담고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된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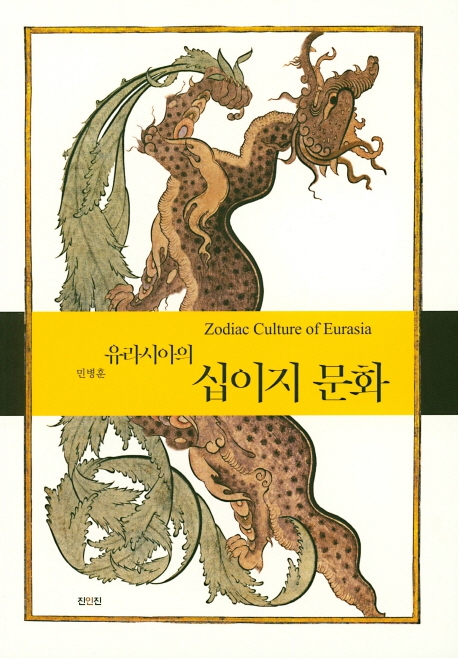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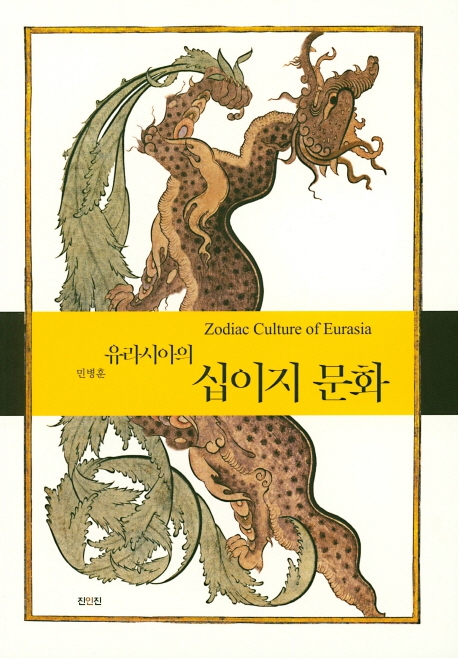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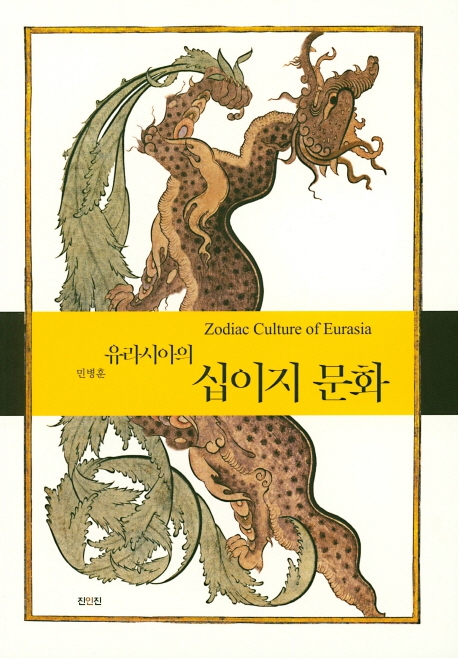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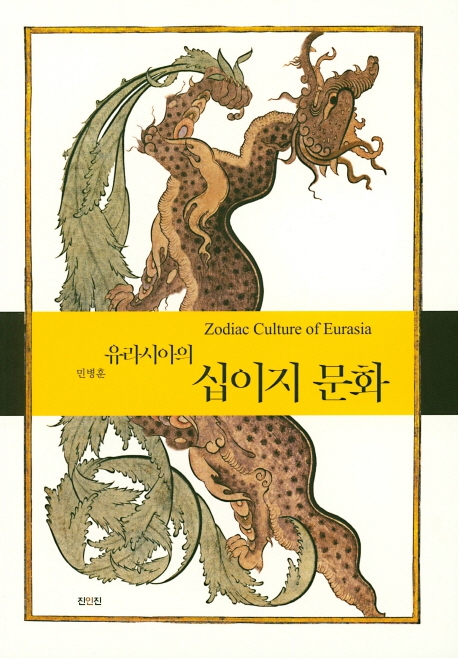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