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24 18:26
수정 : 2019.02.25 1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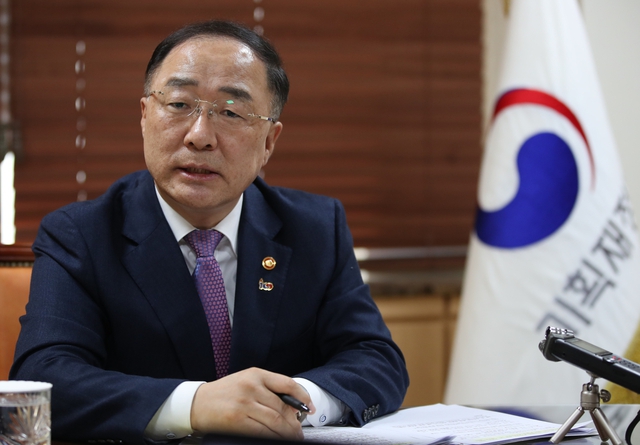 |
|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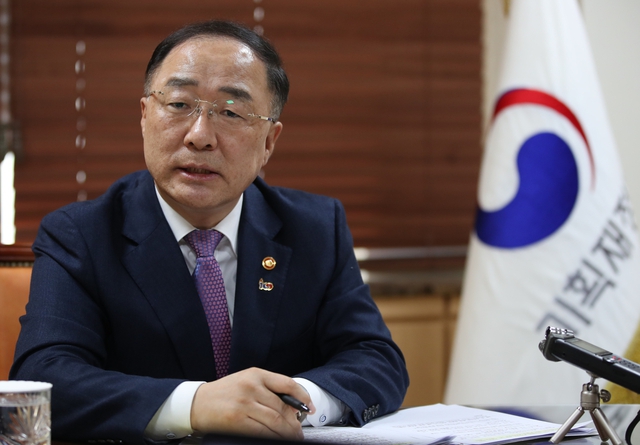 |
|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업 상속제)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최고경영자(CEO) 혁신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가업 상속 요건이 선진국보다 엄격해 기한 문제를 포함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정부안을 4월께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에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업 상속제’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 자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줘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97년 처음 도입됐을 때는 중소기업에 한해 1억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해줬으나, 그 뒤 정부가 여러 차례 법을 개정해 2014년엔 연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했고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으로 늘렸다. 일본·독일·프랑스 등 가업 상속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혜택이 크다. 한 예로 일본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 상장기업은 제외된다. 또 세금 감면 대신 세금 낼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한만 연기해주는 ‘납부 유예제’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 공제를 받으면 10년 동안 지분·업종·고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물린다. 상속세 공제 혜택이 큰 대신 요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가업 승계를 명분으로 세금 감면을 챙긴 뒤 기업을 팔아버리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먹튀’ 방지 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요건 완화는 자칫 ‘편법 상속’의 길을 터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가업 상속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정부가 가업 상속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오히려 일본처럼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납부 유예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만약 업종 변경 기준이 산업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겠다.
자산 불평등과 소득 격차 탓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고착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각종 공제가 많아 2017년 기준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이 3.1%(22만명 중 6896명)에 불과하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이유다. 대주주,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게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다.
▶ 관련 기사 : 홍남기 부총리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 관련 기사 : 미국·프랑스 달구는 ‘부유세’…한국은 어떻게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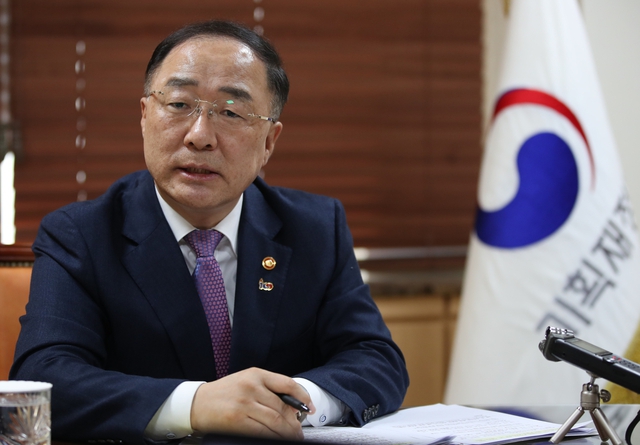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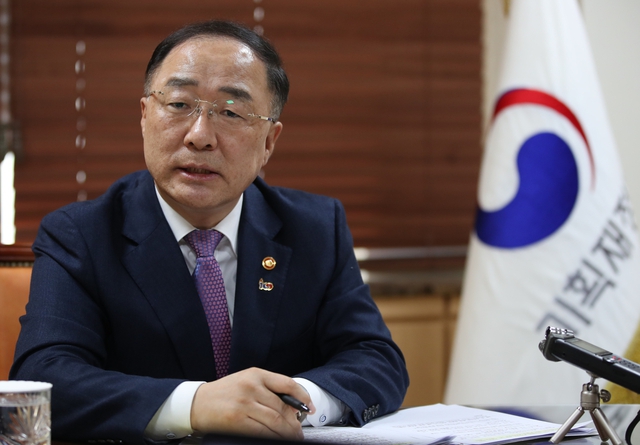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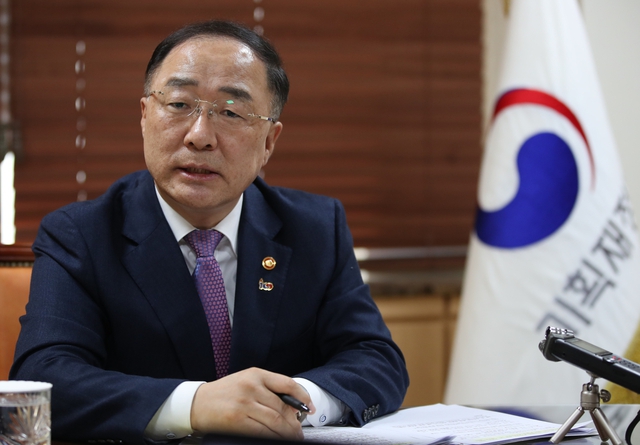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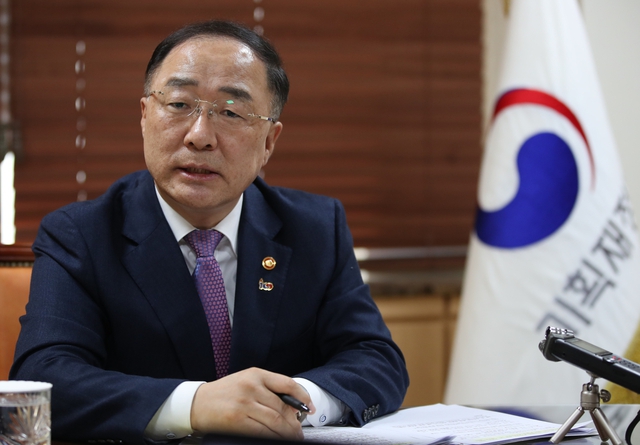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