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2.26 05:01
수정 : 2017.12.26 1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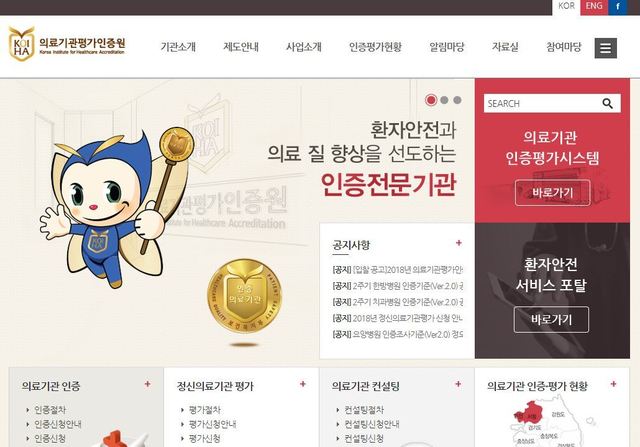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
|
의료기관 인증제 ‘유명무실’
휴가자 복귀·환자 퇴원유도 등 방식
투약 부작용 설명·바코드 팔찌 등
갑작스런 친절, 약 먹는 물까지
이대목동도 같은 절차로 ‘4년 인증’
전문가 “이대로는 더 이상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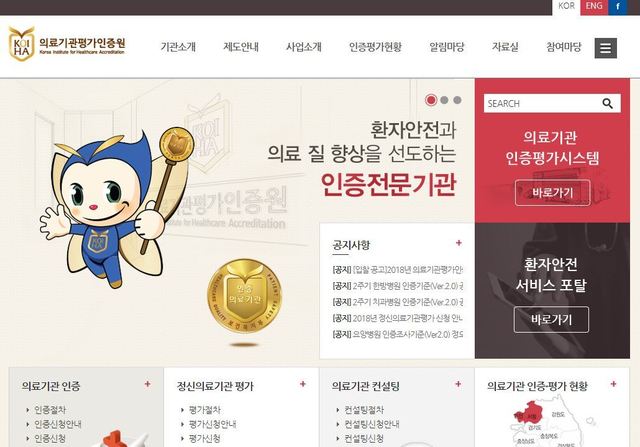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
|
서울 이대목동병원 등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의 평가인증제도가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벼락치기’와 ‘보여주기’식 준비로 충분히 가능한 현행 인증 체계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4년간 유효한 인증을 얻으려고 여러 의료기관은 인증 평가가 이뤄지는 며칠간 벼락치기 하듯 평가·인증 과정을 치러낸다는 지적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인증도 2014년 12월9일부터 12일까지 고작 나흘 동안 진행됐다.
25일 여러 대형 병원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4년마다 한번씩 치러지는 인증원의 인증 절차는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평가인증 기간이 되면 환자를 최대한 빼서(퇴원시켜서) 병원을 비워둔다. 반면 인증에 필요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휴직자와 휴가자 등 병원 인력을 최대한 복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인증 스트레스’ 탓에 인증 평가 기간을 앞두고 병원을 그만두는 간호사도 많다”고 전했다.
‘인증 대비 암기시험’ 등 진풍경도 펼쳐진다. 인증 기간에 각 병원은 조사인력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게 ‘우수 직원’을 선발해 현장에 배치한다. 또 다른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인증 기간과 예상 질문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 병원에선 ‘정예 구성원’을 선발해 약속된 답변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해 인증 평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평가 땐 조사 인력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해가며 대비하기도 한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당선자는 “인증 평가 날짜가 되면 병원 직원이 조사인력을 따라다니며 ‘지금 몇 층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실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선을 계속 알린다. 병원의 일상적 업무 실태가 아닌 보여주기식 평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정리한 자료를 봐도 이런 행태가 잘 드러난다. 노조가 낸 ‘의료기관평가제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보면, 각 병원은 평가 기간이 되면 환자 예약을 덜 받고 퇴원을 유도해 평소 붐비던 병원 주차장이 텅 비게 된다. 환자들은 평가 기간 중 갑작스러운 ‘반짝’ 친절과 자세한 설명에 당황해하기도 하는데, 특히 평가 기간엔 투약 시 부작용 등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환자에게 약 먹을 물까지 제공된다. 당연히 병원 인력은 평소에 견줘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대부분이 시설이나 연구 실적 위주여서 적정 인력 확보 여부는 형식적으로 평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다수 병원이 간호사 등의 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재심사해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인력 충원은 즉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단 넘어가고 보는 것이다. 환전안전이나 의료의 질을 개선하려면 병원 내 적정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인증원을 꾸린 주체가 병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이다보니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대목동병원도 과거 ‘엑스레이 좌우 반전 사고’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결핵 감염 사고’ 등 여러 의료사고 논란에도 단순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은 물론 의료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평가, 그 결과로 보상과 불이익이 주어지는 체계가 작동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의료 현장에선 지금 방식의 평가와 인증으론 더이상 안 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다. 7년간의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동기 부여, 인식의 전환으로까진 나아갔으나 문제는 거기서 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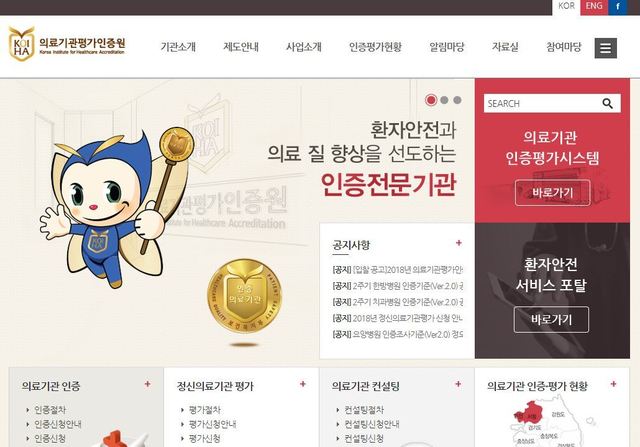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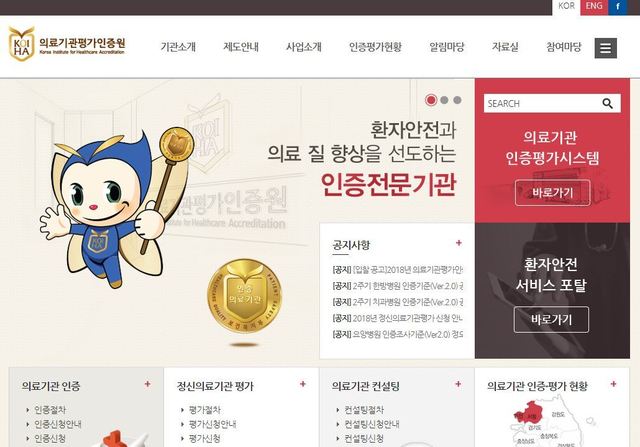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