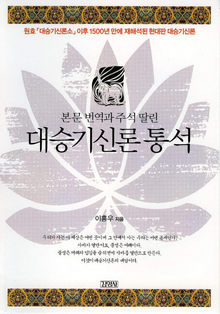 |
‘대승기신론’과 10여년 씨름
현대적 재해석 ‘통석’ 펴내 <대승기신론>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진여(眞如)의 실상’을 드러내는 책이다. 이 책을 쓴 마명은 <중론>을 쓴 용수와 함께 부처의 환생으로까지 추앙받는 인물이다. 이 탁월한 저서는 중국에까지 ‘동방의 대성자’로 알려진 원효가 해석함으로써 더욱 빛을 발했다. 바로 <대승기신론소>다. 한국 불자들에게 부처만큼이나 추앙받는 원효대사가 해냈던 이런 해석에 1300여년 뒤 불교에 문외한인 한 교육학자가 도전했다면. 서울대 교육학과 이홍우(67) 명예교수가 대승기신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승기신론 통석>(김영사 펴냄)으로 답했다. 불교학자도 불자도 아닌 그가 불교계에서도 고수들이나 보는 대승기신론을 곧바로 파고든 계기가 흥미롭다. 서양책 일색인 교육학계 학자인 그는 20여년 전 “지금 당장 영어로 된 교육학책이 한 권도 없이 사라진다면”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매학기 학생들과 유가와 도가 등 동양의 고전들을 함께 읽고 이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대승기신론>도 이 과정에서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승기신론>은 다른 유가 도가의 문헌을 읽었을 때와 다른 무참한 패배를 안겨주었다. 도무지 ‘사람이 한 말’ 같지 않은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현대적인 번역서 한 권 제대로 된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대승기신론>은 묘하게 그를 끌어당겼고, 그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오로지 이 책 해석에 매달렸다. <대승기신론>은 ‘한 끼 밥 먹을 동안’만 올바로 사색하고 하루만 수행해도 모든 부처가 영원히 그 공덕을 찬양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이 가름침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10여년을 이 책과 함께한 이 교수가 그 말이 허풍이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털끝만큼도 과장이 아닌, 사실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데서, 이 교수가 받은 축복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 교수는 침식을 잊고 이 일에 몰두해 몸을 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성적인 두통과 팔다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여래는 존재가 아니며, 진여 그 자체가 양상을 억지로 부여받아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여래가 일체를 안다는 것은 주체와 대상의 구분을 전제로 한 ‘아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곧 대상인 그런 뜻에서 ‘아는 것’을 뜻한다.” “‘상념을 그친다’는 뜻의 삼매, 즉 그침(止)은 ‘진여에의 직관’, ‘진여에의 몰입’과 동일한 의미다.” “‘사바가 곧 열반’이라는 말은 사바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사바를 떠난 다른 곳에서 열반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언뜻 언뜻 빛나는 보석 같은 해석들이 이 사바를 열반락으로 바꿔주고 있다. 불교계 밖의 해석이 불교계에도 좋은 자극이 될 듯하다. 3만5천원. 조연현 기자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