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관순 열사가 1918년 이화학당 재학 당시 모습(원 안)을 담았다고 추정되는 사진.
|
한·일 여성 지식인들 한자리
21~25일 근현대 인물 재평가
남성중심 시각 비판적 접근
한일 여성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현대 한일 여성을 다시 평가한다. 한국은 남성의 눈으로 줄곧 바라보던 명성황후, 유관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일본은 메이지 왕의 왕비와 한일 두 나라 공통의 주제인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가 21일부터 25일까지 여는 ‘2006 한일 여성 지식인 교류 프로그램’에서다. 한일 여성 학자들은 천안 유관순 생가, 여주 명성황후 생가 방문 등을 마치고 24~25일 이화여자대학교 엘지컨벤션홀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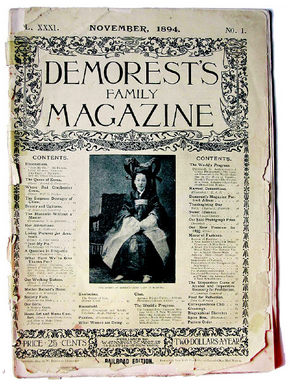 |
|
사진은 1890년대 프랑스 책자 속에서 명성황후로 나와있지만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진 속 여성의 복식도 왕비의 복장인 봉황이 아니다.
|
유관순의 재해석도 새롭다. 유관순은 왜 유독 ‘열사’가 아닌 ‘누나’일까? 권김현영(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씨는 “유관순에 대한 재현을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풀이한다. 〈쟌다크와 유관순〉(1954)에서 작가 정광익은 “지식층의 여성들은 반대현상으로 마지막 골목으로 퇴폐하여 가고 있다”며 책을 엮게 된 동기가 여성들의 정신진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권김씨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쏟아진 유관순 전기가 “남성 부재 상태에서 여성의 규범을 바로잡으려는 남성적 필요에 의해서” 재구성됐다고 주장한다. 유관순은 박정희 정권 때 군사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국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초등학교 교정마다 동상으로 등장했지만 초등학생들은 괴담을 유포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김씨는 80년대부터 초등학교에 떠돌던 유관순 괴담의 공통점은 “얼굴 반쪽은 여자, 나머지 반쪽은 남자” “12시가 넘으면 반쪽은 화상입은 얼굴로 변한다”는 설 등이라고 밝힌다. 이런 괴담을 만들어낸 초등학생들의 반동적 심리는 “피지배집단의 무의식이며 국가와 민족에 동원되는 국민 정체성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와 저항일지도 모른다”는 풀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그밖에도 나혜석 등 신여성의 삶과 메이지 천황의 황후에 대한 표상, 한일 역사적 문화적 관계의 여성주의적 재평가가 이뤄진다. 한류에 대한 일본 여성 지식인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다. 그동안 한일 두 나라 여성학자들이 오래 교류 연구해온 한류열풍은 한국의 기대감과 달리 일본 중년 이상 여성의 오락이란 평가가 양국 여성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바 있다. 한국에서는 국력의 상징쯤으로 여겨져온 한류가 일본 중년 여성들이 “혼자 반복적으로 즐기는” 오락 이상이 아니란 것. 도쿄대 하야시 가오리 교수는 “앞으로 한류는 더욱더 대중매체 논리에 휘말려 통속화, 상업화해 갈 수 있다”며 “민족주의가 일본인들의 일상생활 여러 국면에 잠재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혐한 열풍의 득세가 우연이 아니란 얘기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기사공유하기